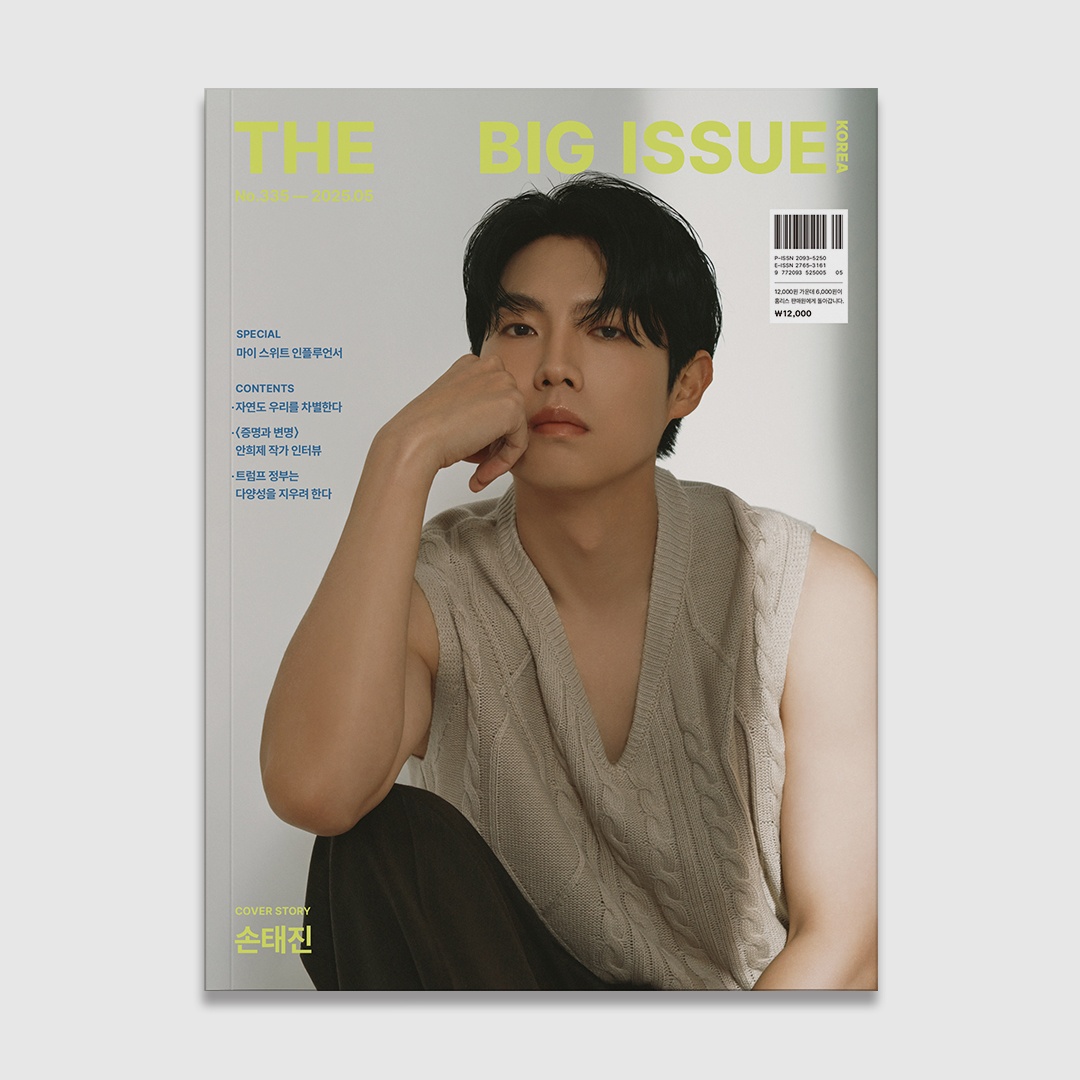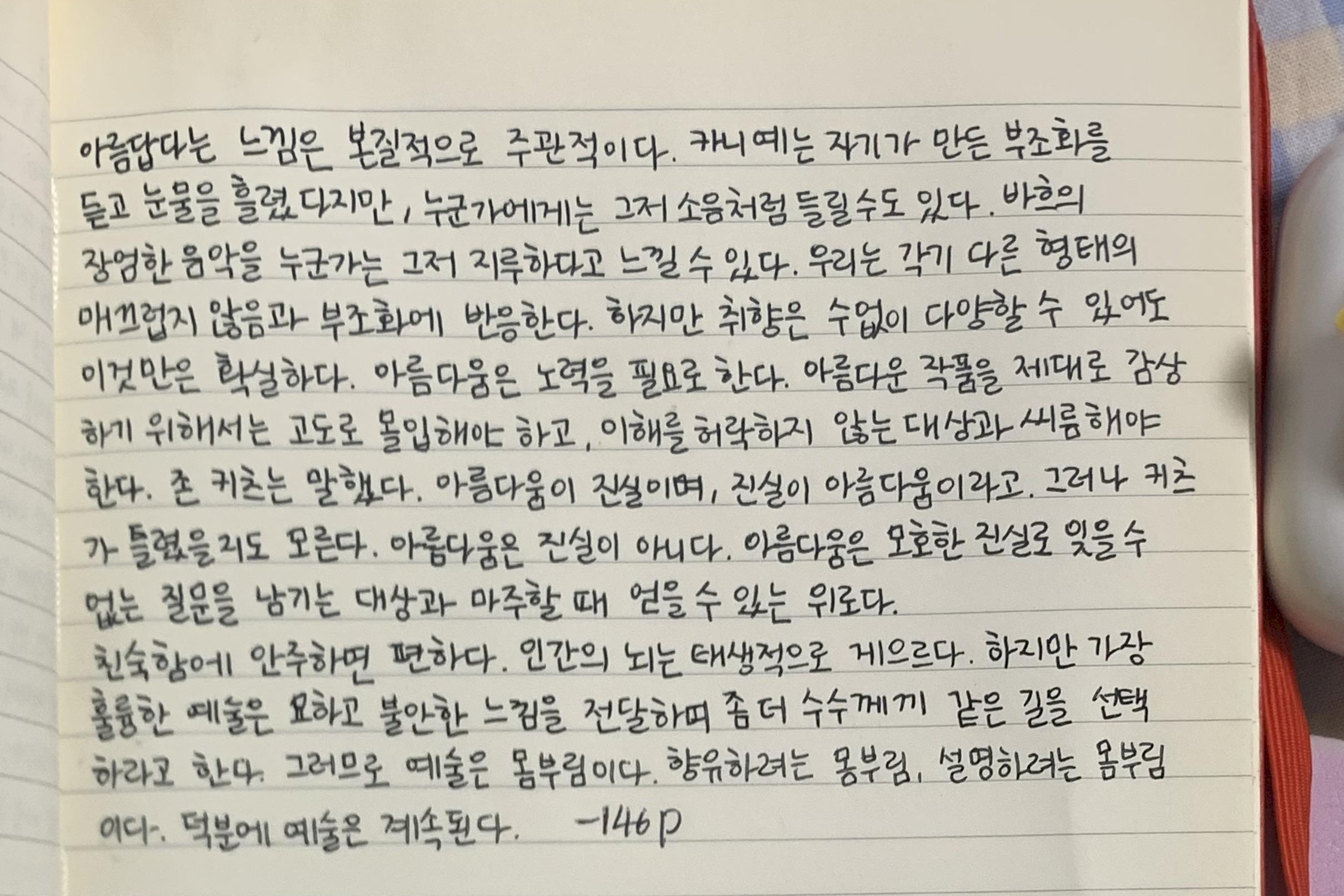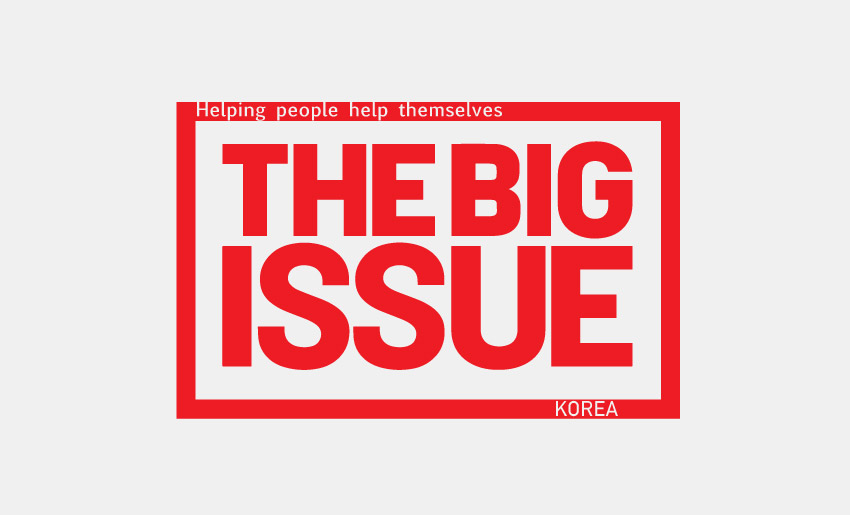잘 팔리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전에는 잘 쓴 글로 인정받는 작가이고 싶었다.
이 두 이야기의 사이는 가깝고도 멀다. 재작년 프리랜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주로 페이스북에서 활동했다. 텍스트 중심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내 글과 생각을 공유하기에 적합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진즉에 만들어두었지만, 작가로 정체화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쓰다가 조금 애를 먹곤 잘 쓰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감각으로 글을 올렸다가 형편없는 '좋아요' 개수에 울적했던 경험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의 문법
하지만 동년배들 대부분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페이스북이 공공연한 '고인물'들의 성지가 되자, 더 늦기 전에 인스타그램 동네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 동네 주민들의 차림새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말수는 적었으며, 이끼처럼 낮은 테이블과 어두운 조명 아래 서식했다. 그렇게 '인스타그래머블 문법'을 익힌 지 두어 달쯤 지나자 인스타 주민들이 하나둘 '팔로우'를 맺어주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나 오프라인 창구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원고 청탁을 받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그때 인스타 동네 입주에 성공했다고 느꼈다.
'뜨는 동네'는 확실히 달랐다. '힙한' 이미지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따사로운 관심을 쬘 수 있는 '일조권'이 좋았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쥔 자원 대비 이미지, '관심 가성비'가 높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외모와 명품이 없어도 '갬성'을 살릴 수 있었다. '힙지로'에 있는 카페에 가서, 보스턴고사리 이파리 옆에 신간 시집을 펼치고, 어떤 시집인지는 알 수 없게 '크롭(crop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는 것)'해 사진을 찍은 다음, 카메라 어플 푸디의 '맛있게4' 필터를 '강도 35' 정도로 적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인스타그래머블 문법'에도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예쁘지 않은 부분을 크롭하고 현란한 보정 필터를 입혀도, 실제 본판이나 값비싼 패션 브랜드의 아우라는 닿을 수 없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라이브 방송이나 스토리로 기록하고, 메신저로 어떤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나 과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 말이다. 꾸밈없는 내 '라이프 노출'은 명품보다도 시간당 '좋아요'가 더 찍히는 게 가능한, 잘 팔리는 이미지였다.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과 나의 구석구석이 '인스타그래머블', 그러니까 관심으로 환산할 이미지로 보이기 시작했다. 잘 팔리는 사람, 작가가 되는 일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이 '잘 팔리는 감각'은 인기가 많은 것과는 다르다고 느꼈는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같아도 나의 내밀한 일상을 자원 삼고, 나아가 나의 자아를 타겟층에 따라 쪼개어 브랜딩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계정에서 셀카를 올려 팔로워가 떨어진다면 셀카도 소비해주는 팔로워를 위해 부계정을 따로 만드는 식이었다.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었다.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감각. 여성으로서 연애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해 '예쁨, 섹시함'의 문법을 잘 구사하는 것. 내 신체 부위를 잘게 나누어 끊임없이 남성적 시선으로 검열하는 것. 대상화・도구화・자기소외의 감각. 여기에는 여성에게 허락된 인정 자본이 '이성애 섹슈얼리티'로 국한된 구조가 깔려 있고, 이렇게 몸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는 여성들에게 손쉽게 '창녀, 꽃뱀, 된장녀' 따위의 말이 붙었다. 일상과 자아를 조각내어 자본 삼는 이들에게 '관종(관심 종자)'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르키소스 신화 혹은 관종
인스타그램 현상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설명이 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으로 '자기애'가 꼽힌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나르시시즘의 유래인 그리스 로마 신화 나르키소스의 변주이기 때문이다. 나르키소스가 저주받은 이유로 자기밖에 몰라서였다는 해석과 교훈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문학으로 보는 그리스신화>의 저자 박홍순은 나르키소스 신화에는 국가가 최고선이었던 시대에 내면이나 개인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에 대한 금기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나르키소스 신화를 지금 버전으로 다시 써보면, "스마트폰과 SNS 사이에서 태어난 계정주 @Narcissus92는 인스타그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행방을 두고 세간에 이야기꽃이 피었는데, 그 꽃말은 '관종'이었다 하더라."일 것이다.
대놓고 관심을 자원 삼는 기업들, 정치인들을 두고서는 '관종'이라 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두고 '질투, 광기, 원한'의 감정 차원으로 읽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행동에 붙는 흔한 설명이다.
노동권 침해로 파업하는 노조는 '이기적'이지만, 경영난으로 인원 감축을 하는 기업은 '진보적 경영'으로 불리는 식이다. '나'의 영역 중에서 주거, 양질의 일자리, 결혼, 자식을 포기하고 일상, 몸으로 협소해진 청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유일한 자본이 된 사회는 잘 논의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중독이 자기애를 매개로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술과 도박에 빠지지 않듯, 중독 현상에는 중독에 취약한 개인과 사회가 있다. 내가 하루에도 인스타 게시물을 세 번이나 올릴 정도로 '인스타충'이었을 시기를 돌아보면 소속된 직장도, 안정된 가계 상황도, 학연・지연・혈연도 없던 상태였다. 최저시급의 카페 노동과 무명의 프리랜서 생활을 병행하던 때, 인스타그램은 나에게 좌절된 인정과 원고 청탁을 이어주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다.
인스타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SNS 디톡스'를 실천하기도 한다. 하지만 SNS는 우리 삶에서 그리 간단히 발라낼 수 없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디톡스 할 수 없듯, SNS를 통해 관계맺기, 업무, 정보 검색이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SNS는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인스타그램 중독을 다루기 위해 혼자 '머리에 힘주며' 수행하기보다, SNS를 이용하는 나의 주변 관계망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먼 훗날 우리들이 '저주받은 나르키소스 ver.2'로 전해지지 않기 위해 왜 우리가 관종이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나누고 싶다.
글 도우리
칼럼니스트. 인기 있는 글을 쓰는 데 재능이 있다.
이제 2등의 글, 갈팡질팡하는 글, 못생긴 글을 쓰려 한다.
인스타그램 문화를 다룬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