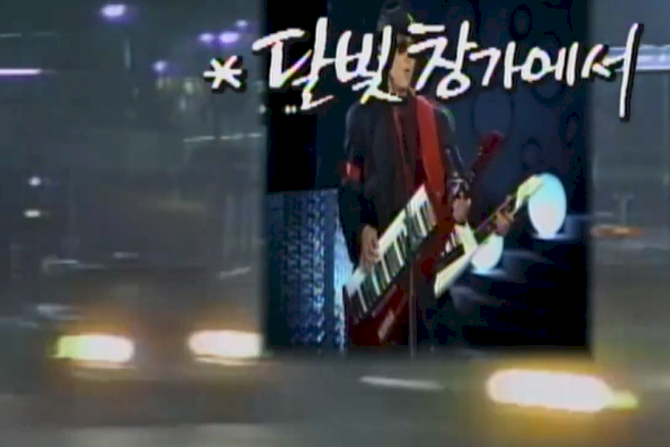글. 김윤지 | 이미지. 유튜브 〈위즈TV〉 캡처 화면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야구밖에 없다지만, 어쨌든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 10개 구단 팬들이 하나가 되는 국가대표 야구 경기가 끝나고 정말 최종 비시즌이 찾아온 11월 말, 야구 대체재 찾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쩐지 공놀이는 공놀이로 대신해야 할 것만 같다. 여자 배구는 이미 작년에 도전했다가 실패로 끝났다. 축구는 야구와 시즌이 겹치니 패스. 이제 남은 건 농구 하나다. 마침 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기 무섭게 농구 시즌이 시작돼 개막전부터 열심히 챙겨 보기 시작했다. 따로 응원하는 팀도 없어서 경기가 있는 일주일 내내 모든 경기를 지켜보며 마음이 가는 팀이 있는지 물색했다.
농구에 대해 아는 거라곤 〈슬램덩크〉뿐. 야구만 봐왔던 내게 농구는 그야말로 스피드의 스포츠였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도, 심지어 몇십 분씩 줄을 서 먹을 걸 사와도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야구와 다르게 잠깐만 눈을 떼도 스코어가 휙휙 바뀌었다. 잠시 통화를 하고 왔더니 상대 팀이 3점 슛을 두 개나 넣어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마치 야구를 10배속 해놓은 듯한 속도감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하느라 경기를 보고 나면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무언가 휘몰아친 느낌이랄까. 1쿼터에 10분씩 총 4쿼터. 시작하면 세 시간은 기본인 야구와는 다르게 한 시간 반에서 길어도 두 시간이면 끝나니 허무한 느낌마저 들었다. 아니, 이렇게 끝이라고? 게다가 매일 모든 팀의 경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6일간 쉬지 않고 계속되는 도파민에 익숙해진 야구팬에게는 다소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