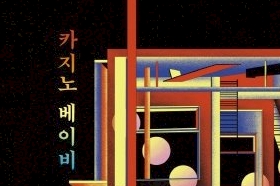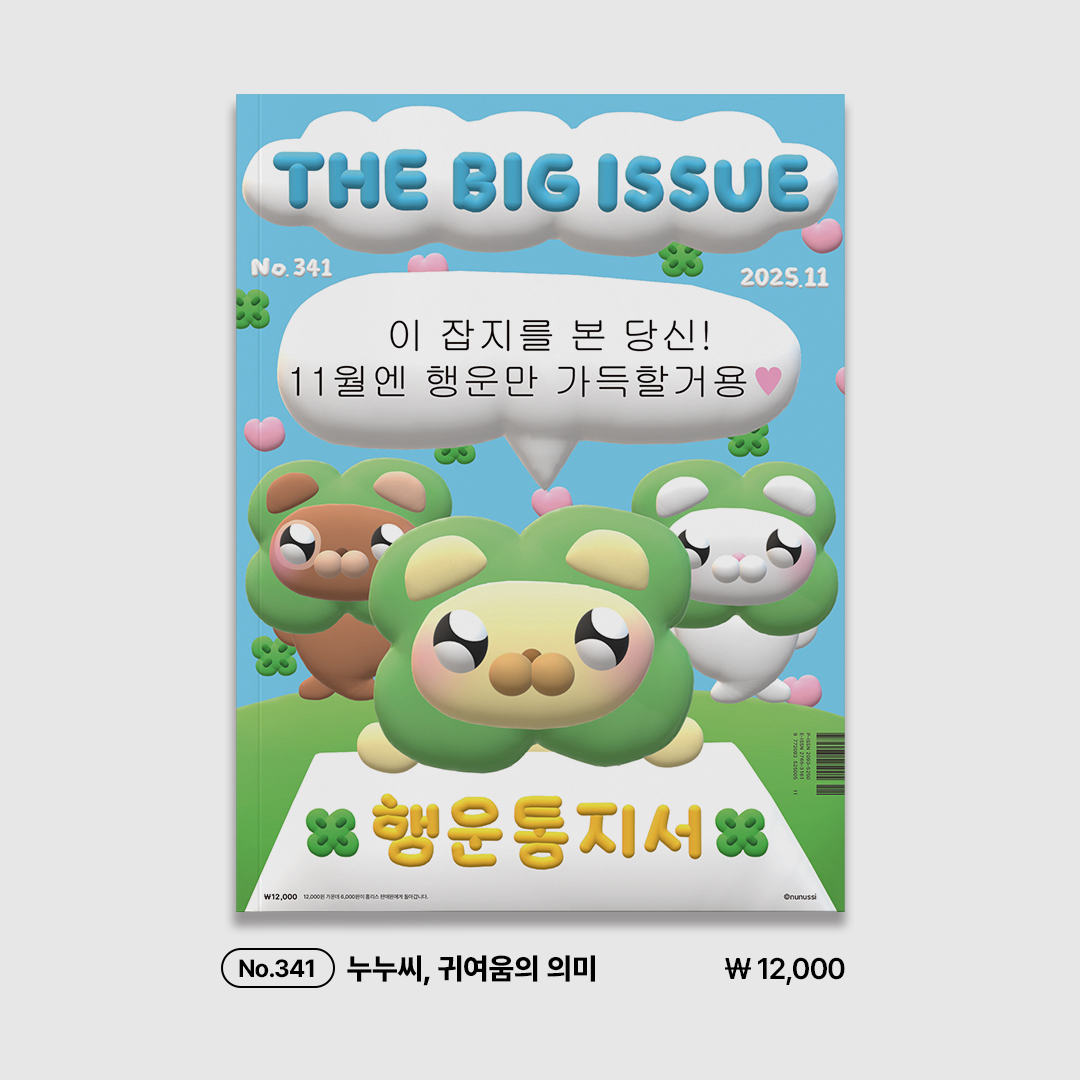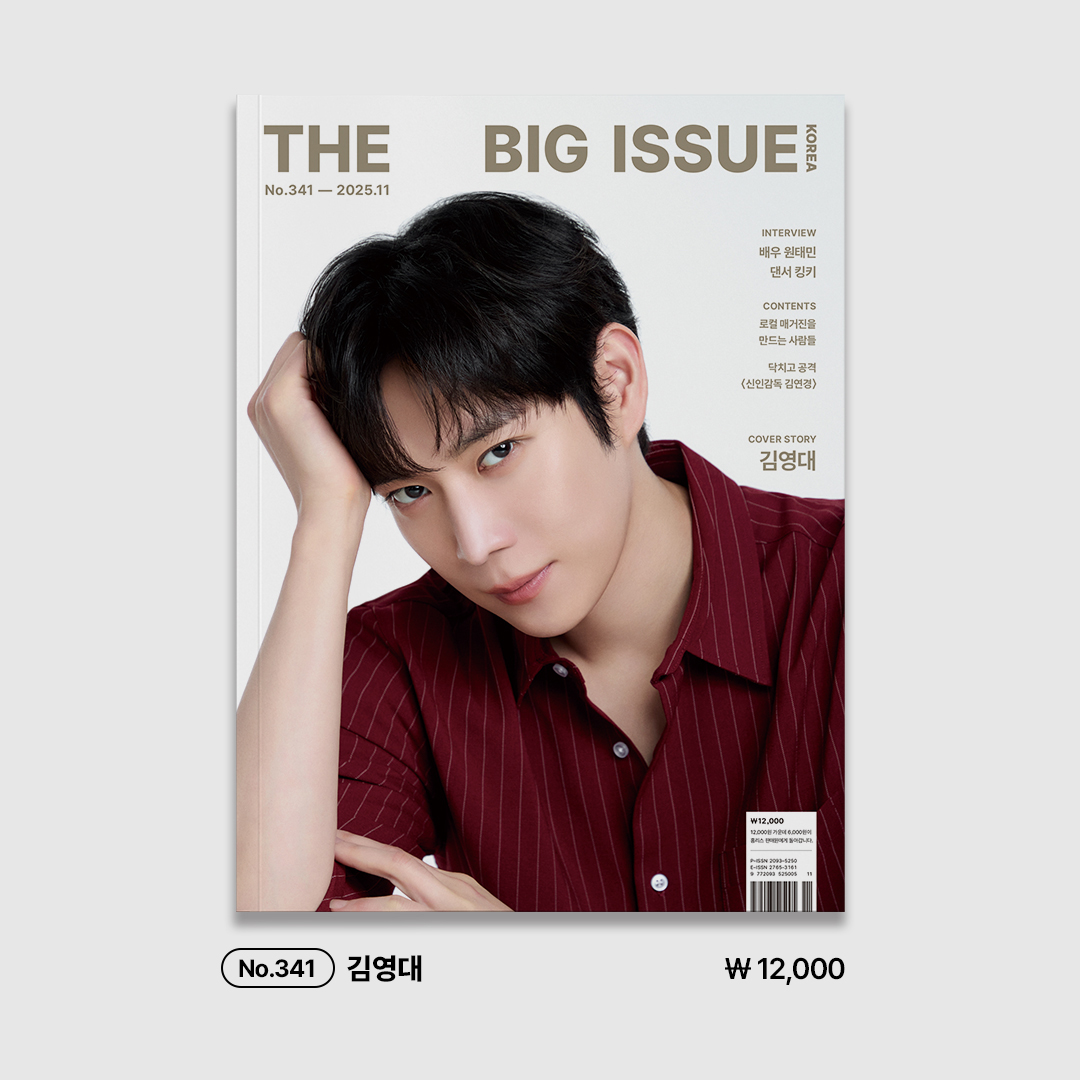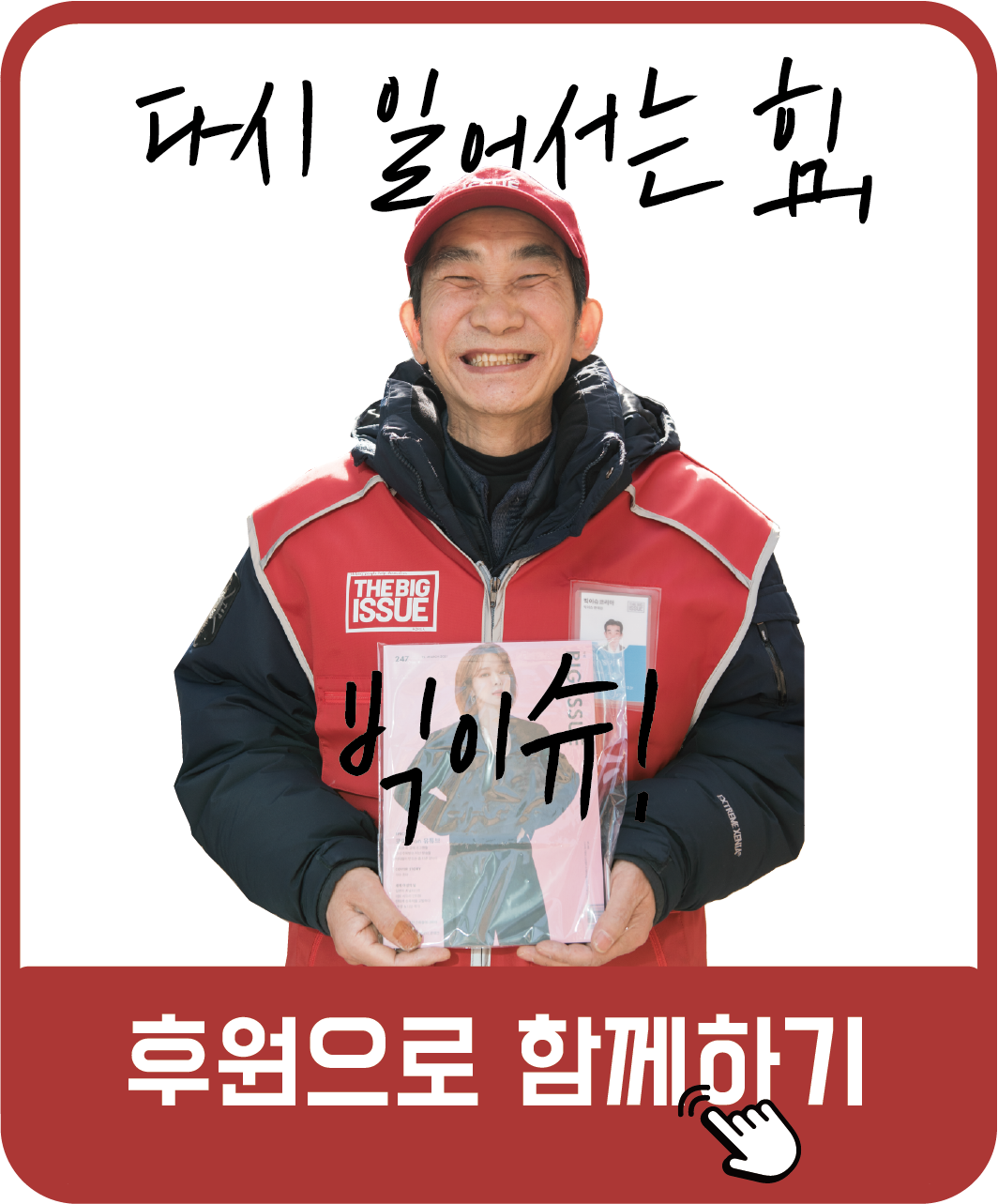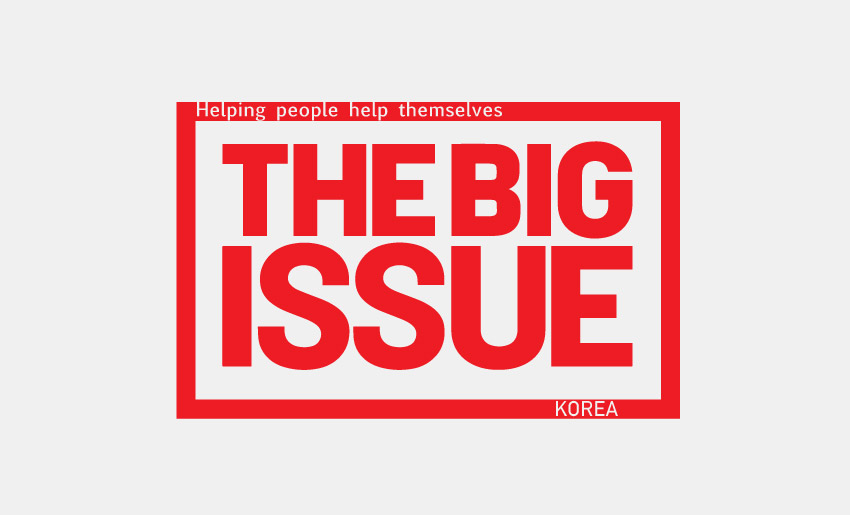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최저임금 문제를 생각해보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둔화시키는지는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다. 왜냐면 두 주장 모두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경기가 호황이면 술 소비가 늘어난다,
누구는 경기가 불황이면 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당연히 두 주장 모두 통계가 존재한다.'

ⓒ unsplash
다니엘 페나크(Daniel Pennac)의 《몸의 일기》는 일기 형식으로 쓰인 소설이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집안일을 해주는 비올레트 아주머니와 유사 모자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주인공이 14세가 되던 해 어머니와 다름없는 비올레트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다.
"비올레트 아줌마가 죽었다. 아줌마가 죽었다. 아줌마가 죽었다. 아줌마가 죽었다. 아줌마가 죽었다 (…)
아줌마가 죽었다. 아줌마가 죽었다. 이젠 끝났다."
지면 관계상 줄였는데, 작가는 책에서 아줌마가 죽었다는 말을 두 페이지에 걸쳐 총 149번 썼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과 슬픔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절절하게 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담담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슬픔을 짐작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슬픔을 압도적인 횟수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책을 가득 채운 문구를 상상해보라. 독자가 슬픔을 느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글쓴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의 아름다운 묘사는 가짜로 꾸며낼 수 있지만, 149번 추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가가 지면을 때우려고 한 게 아니라면 말이지.

ⓒ unsplash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양으로 치환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그 행위를 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을 쓰느냐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게 양으로 결정된다.’고 잔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양이 전부다. 당신이 아무리 독서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당신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모두 쇼핑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의 취미는 독서가 아니라 쇼핑이 맞다.
우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데이터로 증명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당신의 입보다 당신의 행동을 모은 데이터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 현재 데이터는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과 동일한 힘을 가진다.

ⓒ unsplash
데이터는 무슨 말이든 한다
2012년에 ‘사망유희 토론배틀’이라는 이벤트가 열렸다. 토론이라면 누구에게도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좌파 논객 진중권을 불러놓고 우파 논객들이 차례차례 도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진중권은 의외로 쉽게 무너졌다. 대회를 기획하고 직접 토론자로 참석한 변희재는 이 토론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폭풍처럼 쏟아냈다. 그러고는 얄미운 말투로 덧붙였다. “이건 모르셨죠?”
몰랐겠지. 세상 누가 그 많은 사례를 알겠는가. 진중권은 결국 패배를 선언했다. 그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던 진보적 성향의 네티즌들은 변희재가 가짜 데이터를 내놓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변희재는 굳이 가짜 데이터로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다. 세상에는 온갖 데이터가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은 '데이터 만능 시대, 거짓은 필요 없다 (2)'로 이어집니다.
글.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