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상 너머의 세상 (1)'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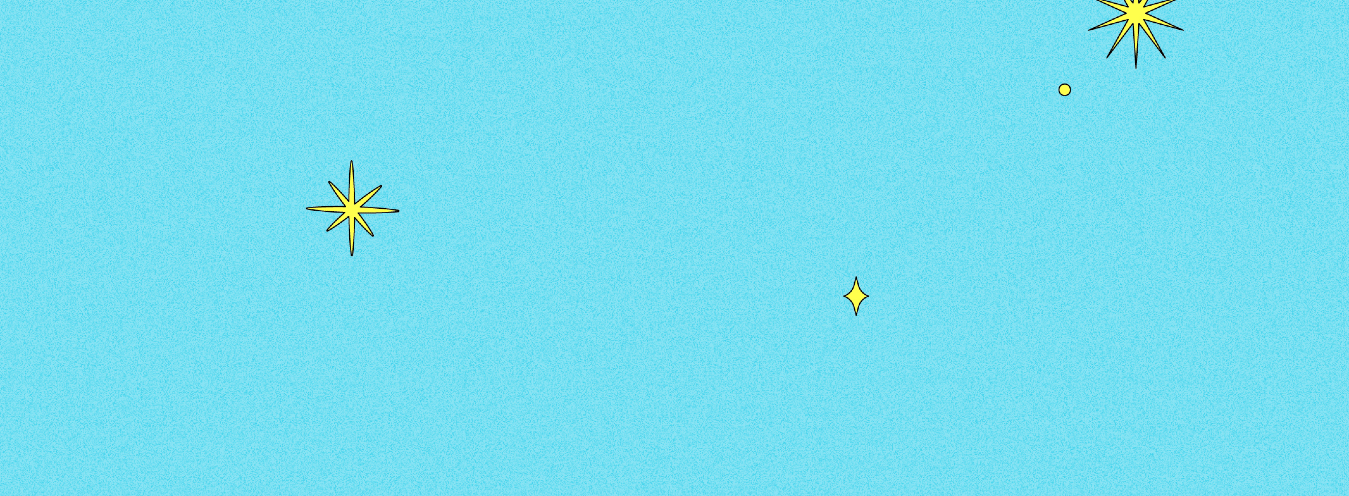
지금 나는 책상 없이 지내는 중이다. 어차피 집에서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아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별로 필요가 없다. 이 글도 잠든 아기 옆에서 어둑한 스탠드를 켜놓고 엎드려 쓰고 있다. 우리 네 식구는 방 하나가 딸린 스무 평 조금 안 되는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중이다. 방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긴 하다. 그렇지만 아기 짐이 많아지다 보니 지금 그것은 책상이라기보다 수납 선반 비슷한 무엇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아기는 몸집이 작으니까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마 머리를 쥐어짜면 다소 비좁은 이 공간도 획기적으로 활용할 묘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도 공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프리랜서 성우이다 보니 회사나 사무실에 내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책상이 없다고 생각하니 살짝 서운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왜 유독 테이블이 넓은 카페에서 마음이 여유롭고, 원룸을 벗어나자마자 그렇게 커다란 책상부터 사들였는지 이해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기억이 났다. 어릴 때 나는 집에 비해 엄청 넓은 책상을 가졌던 것이다.
나로 인해 완벽해지는 어떤 그림

초등학생 때였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 한 켠에 낯선 문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집 문 하나가 떨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집은 멀쩡했다. 허리춤까지 오는 튼튼한 서랍장 두 개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다. 문의 정체는 다른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버린 다용도실 문짝이었다. 문짝은 곧 다듬어지고 페인트칠이 되어 두 개의 서랍장 위에 교각처럼 뉘어졌다. 그 위로 초록색 부직포와 유리가 덮였다. 그렇게 나는 광활한 책상의 주인이 되었다. 한동안 책상이 너무 넓다고 생각했다. 집의 공간에 비해 책상만 지나치게 큰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곧 적응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책상이 너무 좋아졌다. 한 켠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 여러 권의 책과 노트를 동시에 펼쳐 늘어놓아도, 책상 위가 별로 어지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곳은 내가 아는 가장 너그러운 장소였다. 거기 앉아 책을 읽고 그날 본 영화를 다시 떠올리고 라디오를 듣고, 엎어져서 잠도 잤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존재가 되었듯이, 나의 책상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곤 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집 다용도실이 아닌 수많은 꿈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 문을 통해 이런저런 미래를 엿보았다. 대학 캠퍼스의 풍경을, 분주한 사무실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 우리 아빠처럼 이른 새벽 잠든 아이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나의 뒷모습을 그려보았다. 내가 아직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조차 모르면서, 이런저런 그림 속에 나를 끼워 넣어보았다. 찾고 싶었다.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나로 인해 완벽해지는 그림을.
이제 나는 여기 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끔뻑이다 뒤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문은 사라졌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책상은 옷가지와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다. 나는 내가 올바른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다.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그렇게 네 식구였는데, 이제는 내 아내, 30개월 된 작은 여자아이 하나와

6개월 된 더 작은 아기 하나, 이렇게 네 식구다. 여기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 누구라도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완벽하지 못하다.
며칠 전 엄마랑 통화를 하며 내가 그 책상에 대해 쓸 거라고 했더니 엄마는 뭐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쓰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이 책상이 될 수 있고 책상이 문이 되어주는 멋진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나는 책상 없이 지내는 내 모습을 구질구질하다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덕분에 나는 잠든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엎드려 글을 끼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여기저기 머리를 찧을 나이가 지나면, 반드시 집 한가운데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으리라 다짐할 수 있다. 넓은 집은 약속할 수 없어도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리라. 커다란 TV도 필요 없고 안락한 소파도 포기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앉아 문짝만 한 테이블에 각자의 책을 몇 권씩 늘어놓고 같이 책을 읽을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구질구질한 것도 힘든 것도 모르고, 함께 문 뒤의 세상을 그려볼 것이다.
글. 심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