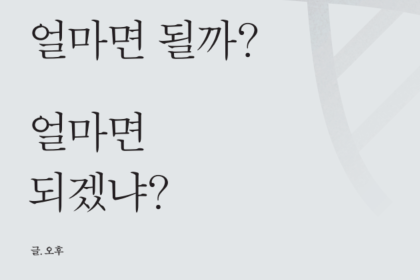이 글은 '<두 사람을 위한 식탁> (1)'에서 이어집니다.

ⓒ 영화 <두 사람을 위한 식탁> 스틸
아픈 몸, 연약한 마음과의 동행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되짚게 된 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이다. 15년 이상 거식과 폭식을 경험하며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채영 씨와 그녀의 엄마이자 대안학교 선생님인 상옥 씨에 관한 이야기인 <두 사람을 위한 식탁>(2023)이다. 영화는 <피의 연대기>(2018)를 만든 김보람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다. 전작이 생리하는 여성들,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온몸으로 피 흘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리의 역사, 생리대에 관한 기록, 여성의 몸에 관한 개인적이자 동시에 집단적이고 연대기적인 서사다. 반면에 이번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사적인 두 여성의 구체적인 사연에 집중해 들어간다. 채영 씨의 섭식 장애의 역사에는 엄마를 향한 복잡한 심경 또한 자리한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로부터 독립해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 채영 씨는 부단히 자기 길을 모색해왔다. 상옥 씨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분투가 있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보낸 젊은 시절과 채영 씨를 홀로 키우며 무주의 대안학교로 가서 선생님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지난한 세월, 딸을 이해하기까지의 자기와의 싸움까지. 영화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두 사람의 역사를 담담히 사려 깊게 그려간다.
섭식 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다큐멘터리를 기대한다면, 이 영화는 그것과는 무관하다. 그보다는 두 여성 각자의 독립기, 두 여성의 동행기라고 해야겠다. 섣불리 화해나 관계의 회복을 타진하지도 않을뿐더러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봉합과 해소돼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며 이 영화의 핵심이자 영화가 견지하는 중요한 태도다.

ⓒ 영화 <두 사람을 위한 식탁> 스틸
여기에는 채영 씨가 섭식을 둘러싼 자신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대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이자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상옥 씨 역시도 채영 씨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 역시도 섭식 장애 그 자체를 주목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지켜봐주려 한다.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 채영, 상옥 씨를 통해 발견한 사랑의 방식이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살면서 접점이라고는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동행하고 있다. 두 개의 선이 나란한 평행선으로. 카메라 역시 그 두 선의 거리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려 한다. 단 한 번도 카메라는 인물들보다 앞서거나 인물들 곁으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두 사람 이외의 다른 인물들, 그들과의 관계를 묻거나 눈 돌리지 않는다. 채영 씨의 섭식에 관한 구체적인 장면도 이곳에는 없다. 영화는 서로의 공간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히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고 설득해온다.
그렇다. 앞선 나의 사적인 고백의 이유 역시 결국 나 역시 영화 속 여성들처럼 아픔과 통증과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저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떠한 몸과 마음의 상태이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돌아보며 그 아픈 상태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싶다.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싶다. 누구나, 언제든, 얼마든지 아플 수 있으니까. 늘 건강해야 한다는 게 되레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 그렇다고 말해온다. 우리 모두 충분히 아픈 몸과 연약한 마음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명한 사실을 과장됨 없이 전하는 것이다.
소개
정지혜
영화평론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쓴 책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영화 ‘해피 아워’ 연출노트와 각본집>(2022, 모쿠슈라)의 한국어판에 평설을 썼다.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영화의 미래를 상상하는 62인의 생각들>(공저, 2021), <아가씨 아카입>(공저 및 책임 기획, 2017) 등에 참여했다. 영화에 관한 글을 쓸 일이 많지만, 언제든 논–픽션의 세계를 무람없이 오가고 싶다.
글. 정지혜 | 사진제공. 필름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