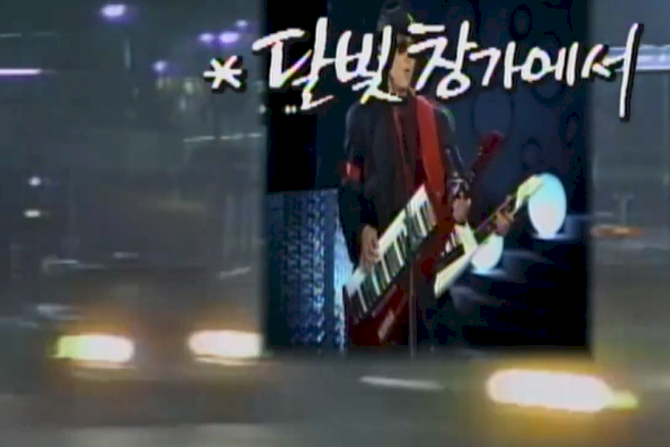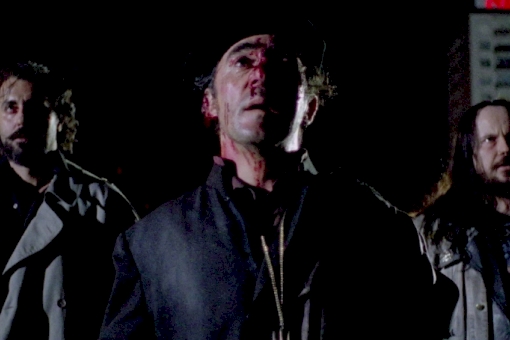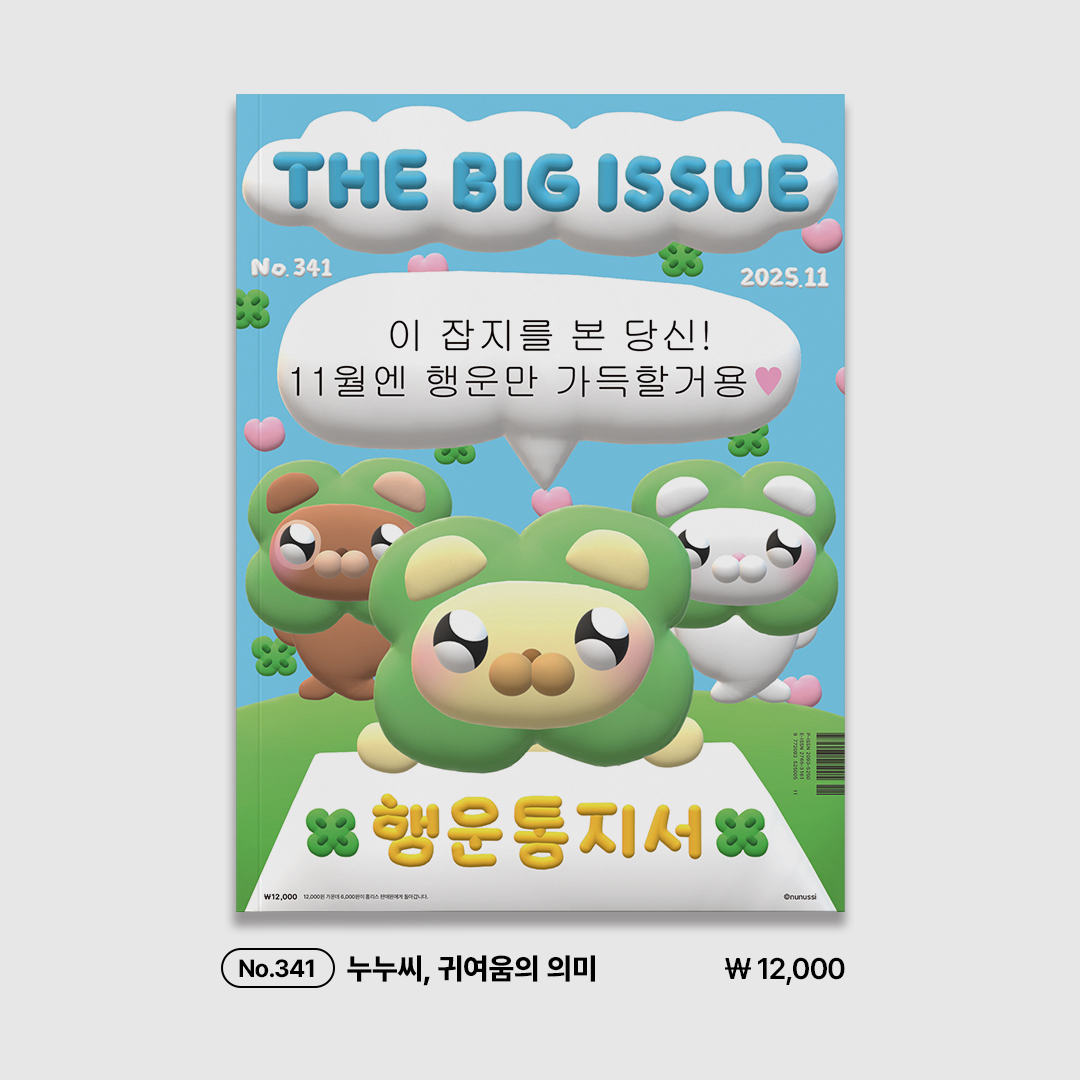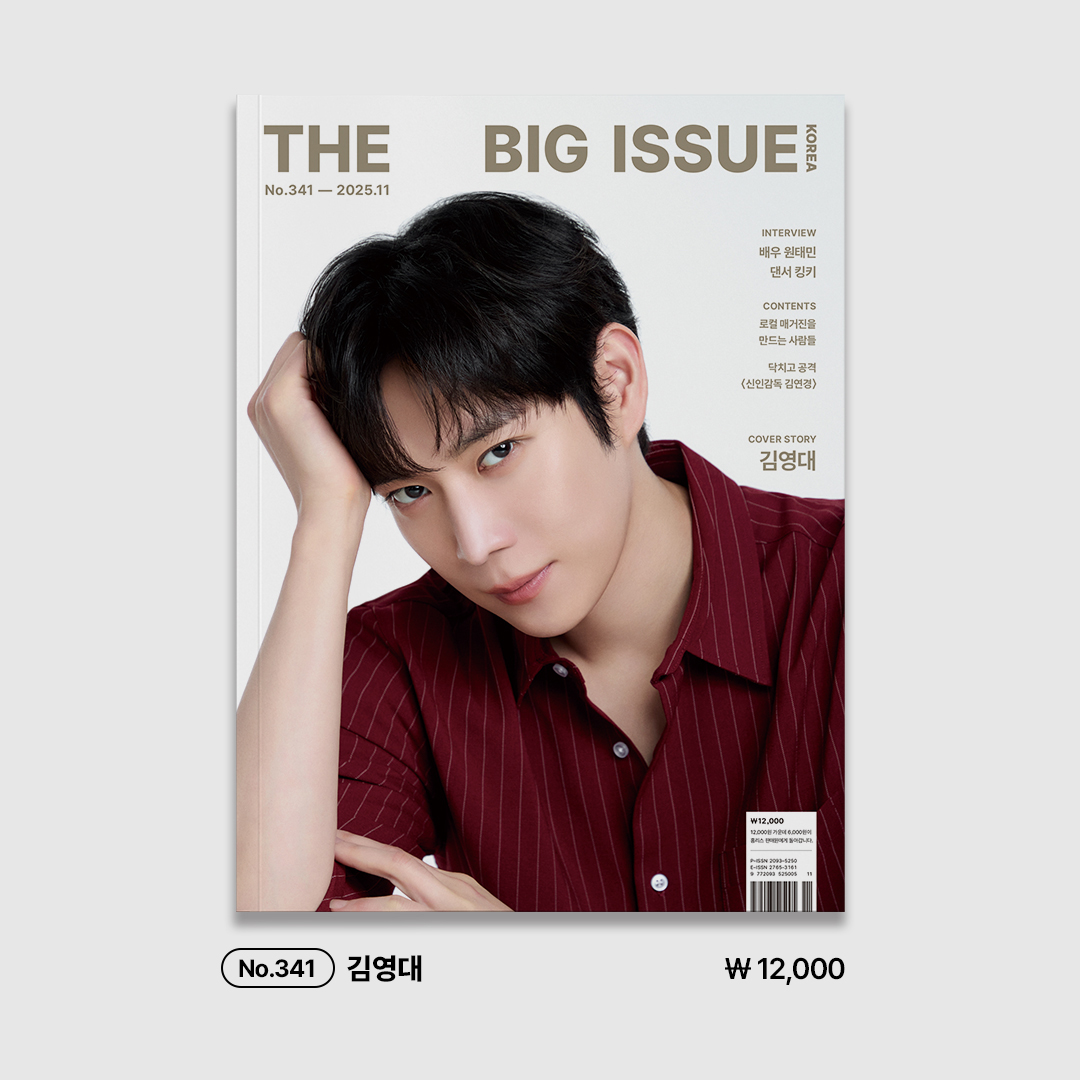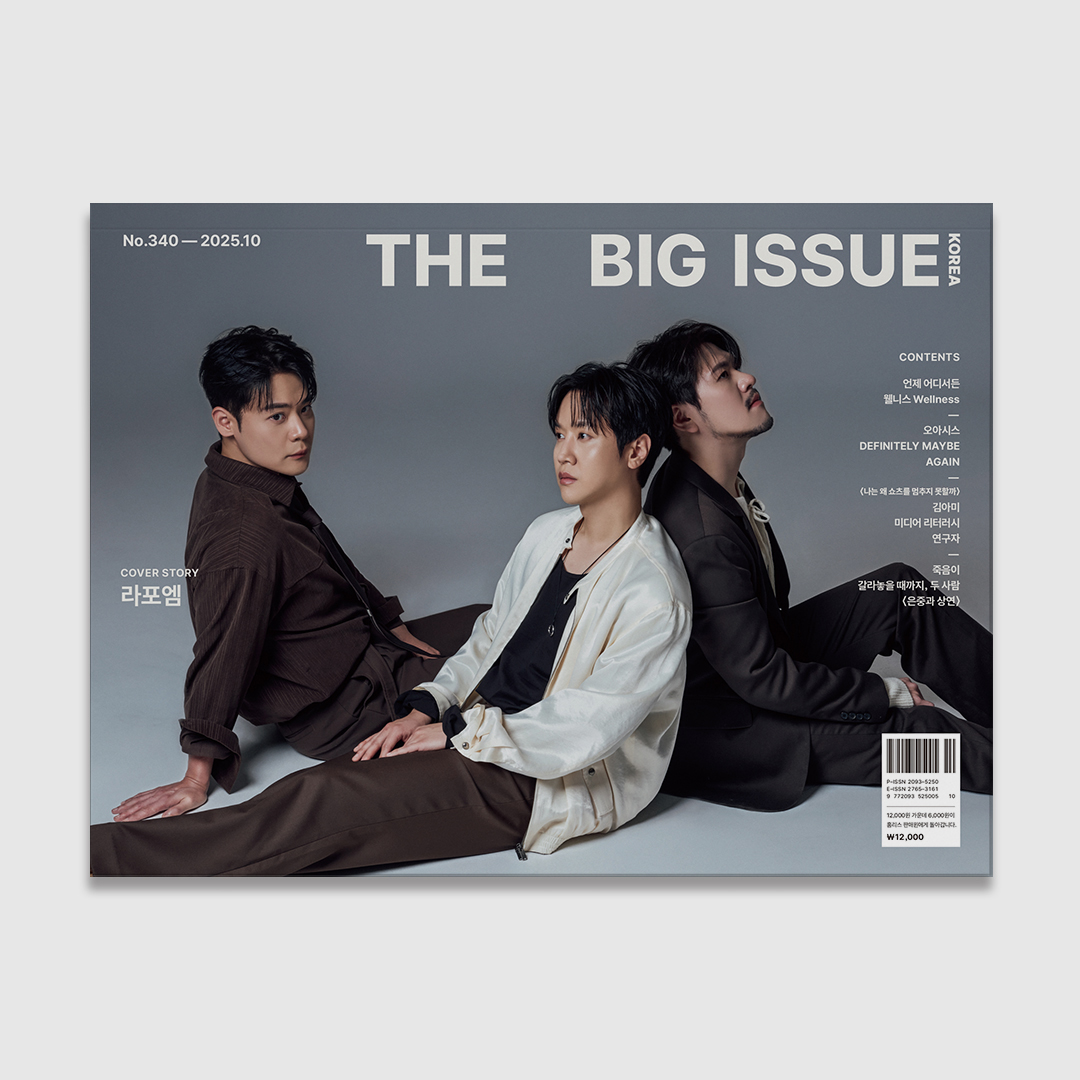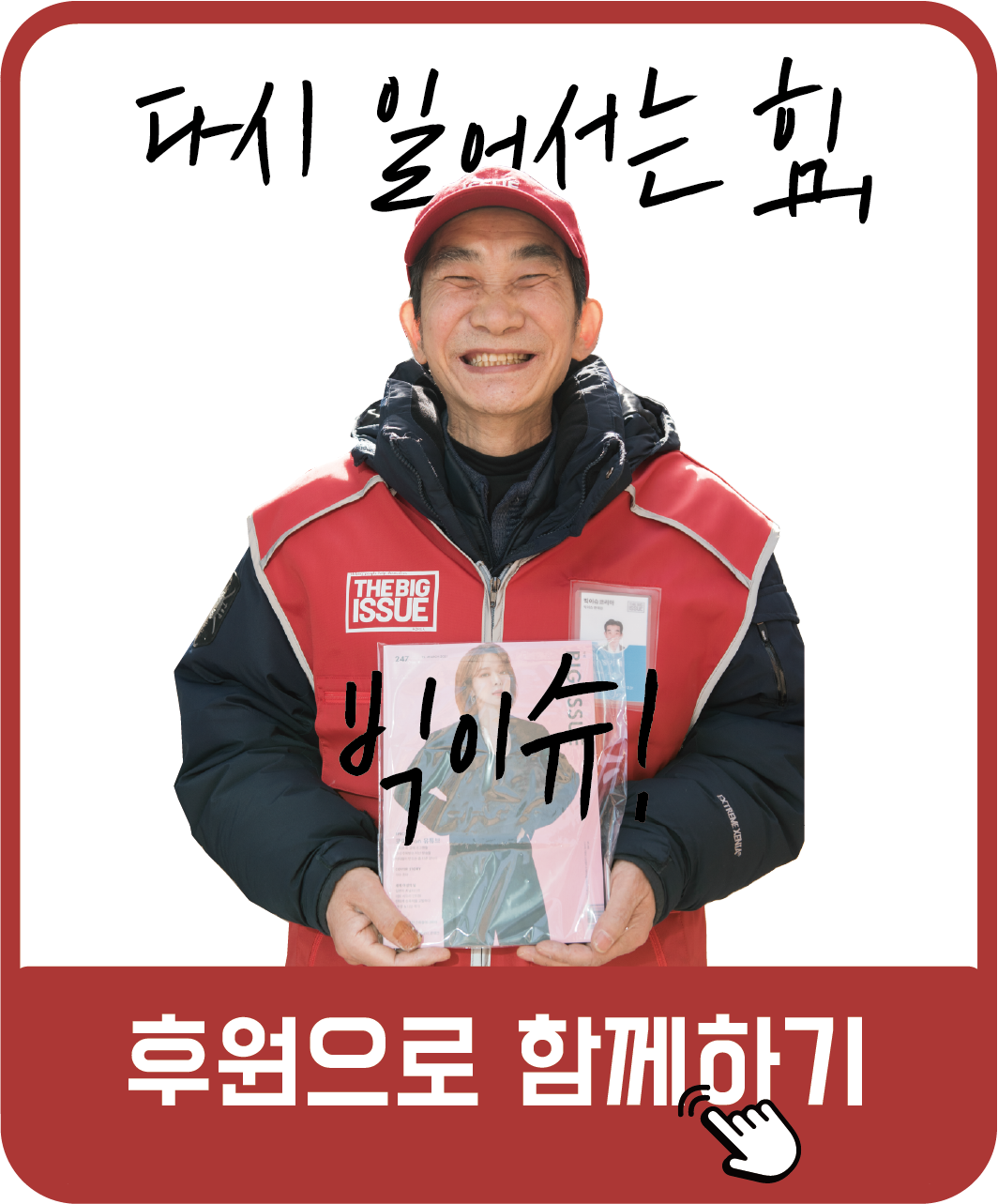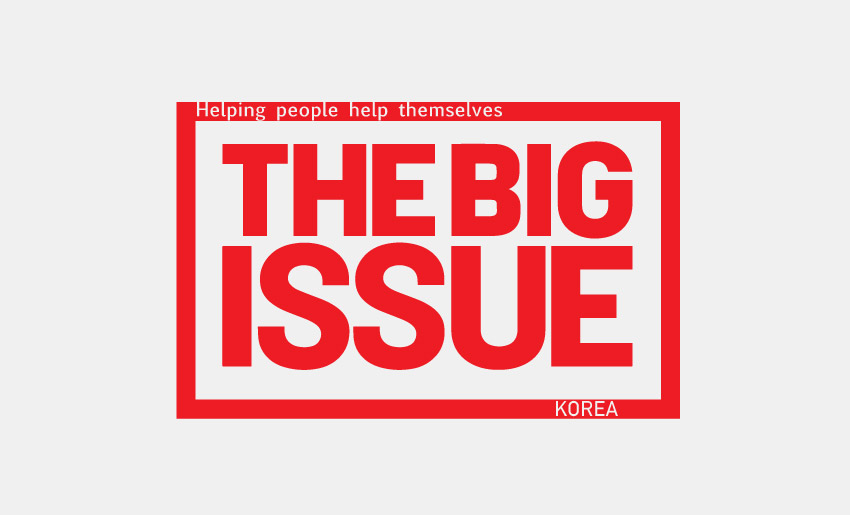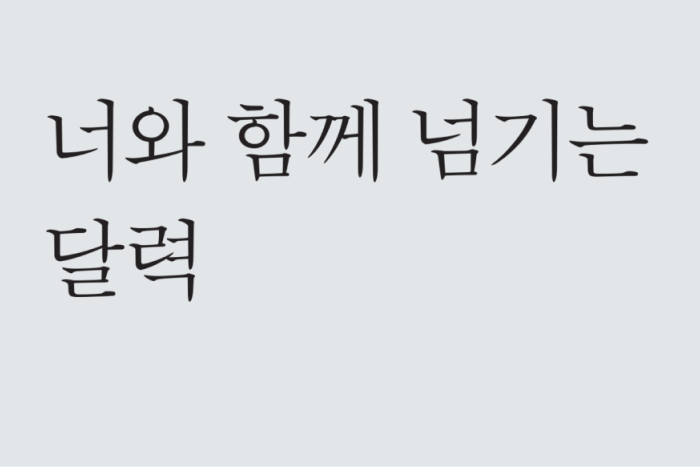
글. 유지영
연말이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이다. 여름 내 더위에 잠시 느슨해진 시간의 흐름은 연말이 다가오고 추워지면서 다시 촘촘해진다.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되는 《빅이슈》 330호에는 한 해 결산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적으려고 마음먹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눈과 귀를 통해 스쳐갔지만, 지난여름 무심코 읽었던 단신에 나온 단어 하나가 며칠 새 걸렸다.
11월 초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주최한 사건기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에 갈 일이 있었다. 각 언론사에서 1명씩, 50여 명의 사건기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마침 세미나 전날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돼 준칙의 내용을 두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열렸다.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이어 6년 만에 그 이름도 내용도 확연히 바뀐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나왔다. 제1원칙을 보고 조금은 놀라고 말았다. 6년 전 3.0의 제1원칙은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4.0의 제1원칙은 아예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살이 감소하는 사례가 보고됐다는 말이 제
1원칙에 덧붙어 있었다.
‘보도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놀랐지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문득 지난여름 올해 자살 사망이 지난해보다 10%가 늘었다는 짤막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이 2014년에 이어 9년 만에 최대치였는데, 올해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매월 20일 즈음 월별 자살 사망 통계(잠정치)를 내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3월에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는데, 한 달간 1,314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3월이 31일이니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 42.4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이다. 재단은 2024년 자살 사망자 수가 한국에서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 15,906명을 넘어선다고 예상했다. 서귀포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를 옆에 두고서 마주한 참혹한 현실이었다.
보도하지 않는 게 능사?
이날 이렇게나 높은 자살 사망자 수와는 아주 상반된 데이터가 소개됐는데,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평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1%의 한국인이 ‘별로/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한 31개국 중에 31위(전 세계 성인 2만 3000명 대상)였고, 과반인 50%를 넘은 건 “한국이 유일했다(입소스).” 자살 사망자가 많은데도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여기는 이 극명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17년 돌연 시작된 깊고 긴 우울증의 터널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23년이었다. 우울증 환자에게 자살은 언제나 유의미한 선택지로 상상해볼 수 있는 결말이었다. 스위스에서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는 안락사 또한 마찬가지였고, 스위스에 갈 여비 정도는 마련해두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품은 이면에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 발버둥 치던 내가 있었다. 비교적 여유가 생긴 최근이 돼서야 안락사를 늘 염두에 두었던 내 내면에 자립과 돌봄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몸이 무서웠던 것이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아몬드, 2022)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나종호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나치 치하의 유대인 자살률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높다.”라고 했다. 의존에 대한 공포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치부하기에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지나치게 취약하다. 기댈 곳이 없으면 무너진다. 낙오한 사람을,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이만 버리고 가겠다는 사회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생명은 소중한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제1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살 사건 보도를 자제하는 기존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겠으나, 기자가 쓸 수 있는 자살을 진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으로 더 다양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보도, 그래서 죽지 말고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말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참사가 더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연말이니 무언가 작은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다. 그러나 2024년을 끝으로 더는 달력을 넘길 수 없는 이들을 먼저 부르고 싶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우리’와 함께 달력을 넘길 수 있게 된다면 무엇보다 기쁠 것이다.
유지영
〈오마이뉴스〉 기자.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함께 만들고 동명의 책을 썼다. 사람 하나, 개 하나랑 서울에서 살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