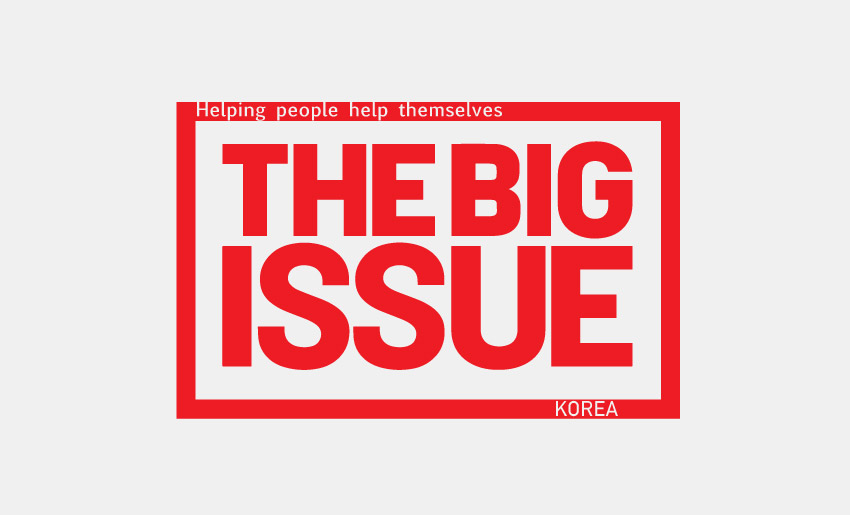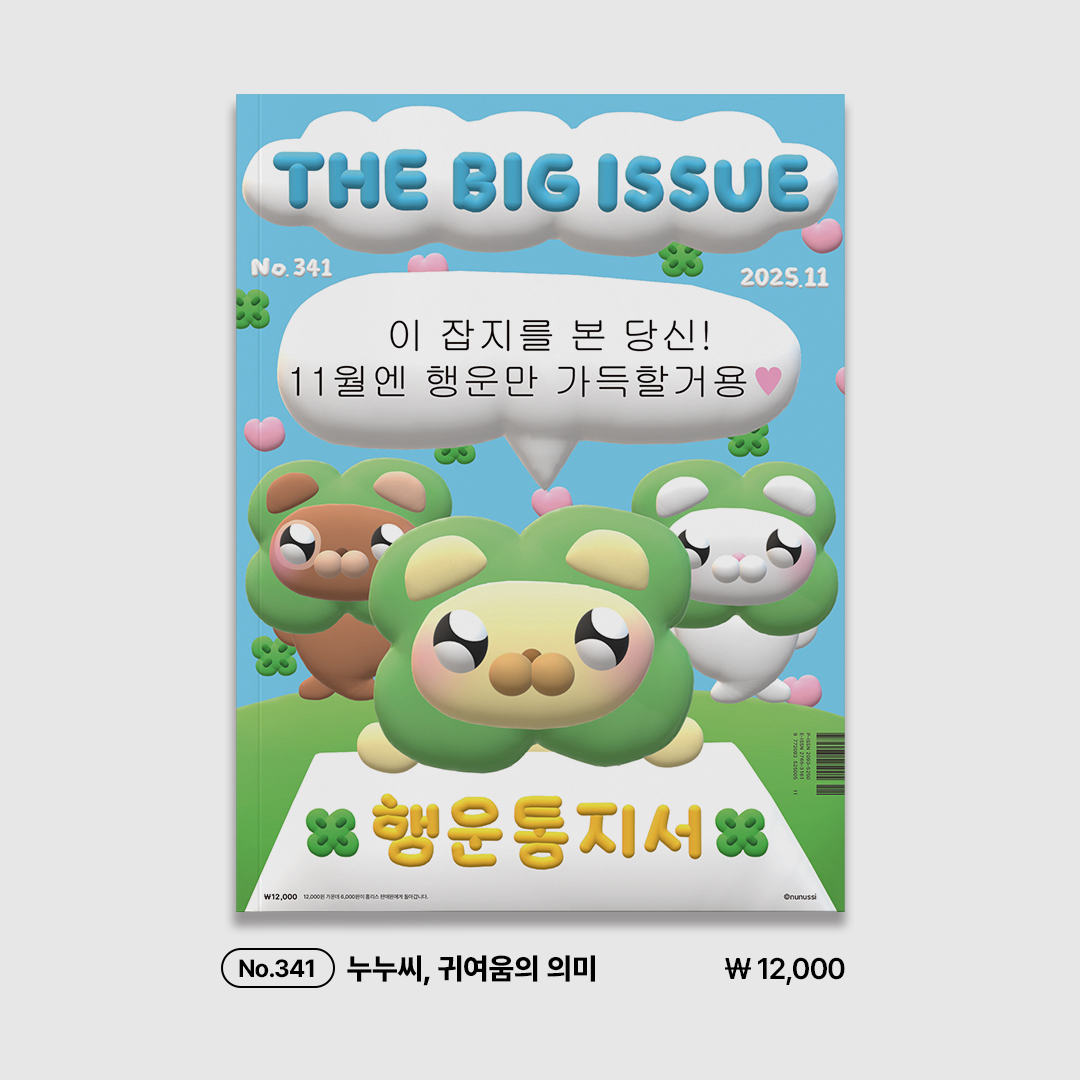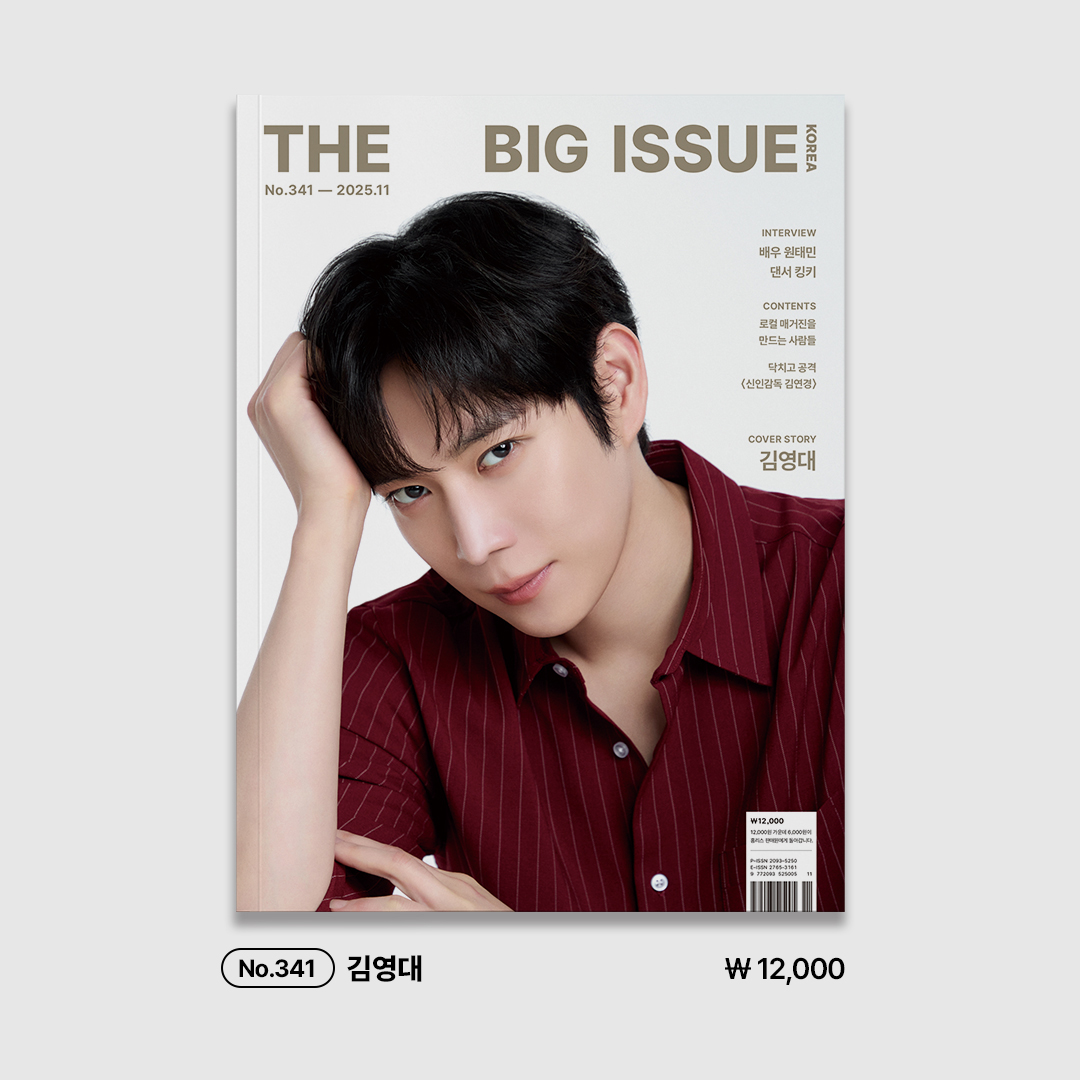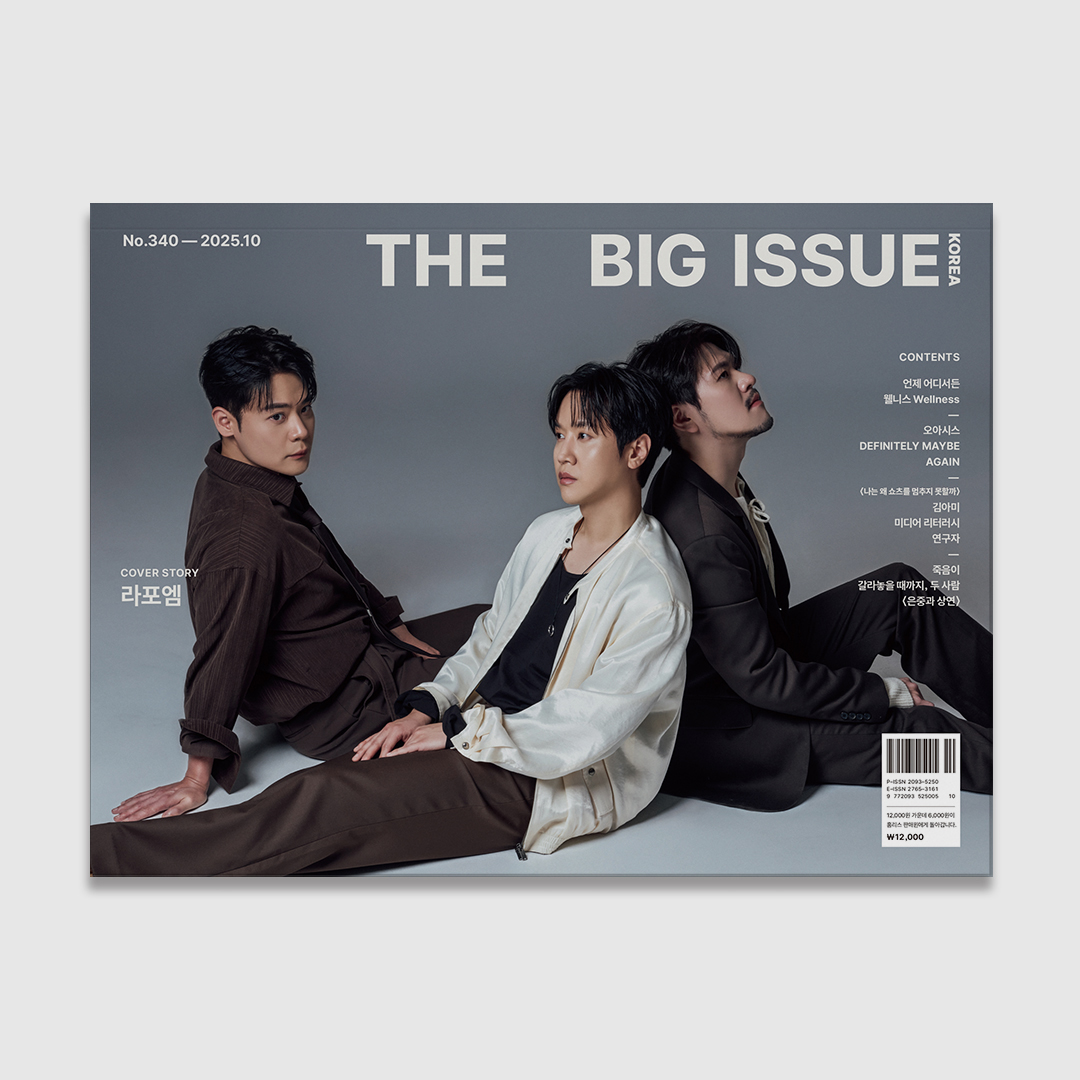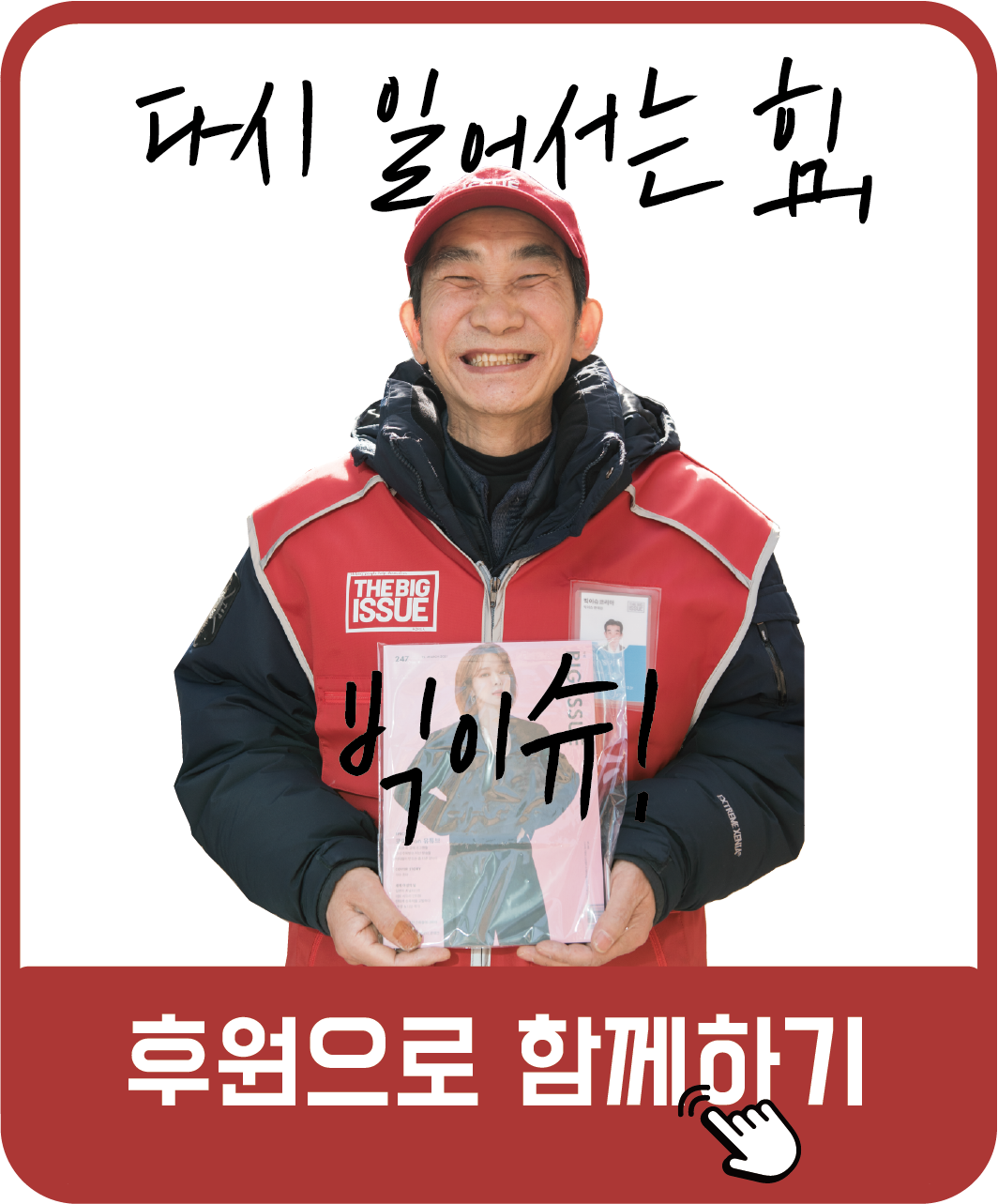순정 만화로 역사를 배우고 우주를 꿈꾸고 혁명을 배웠다. ‘순정’이라는 명명 때문에 폄훼되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순정 만화는 10대 여성 독자들의 문화생활을 좌우하는 당당한 여성 서사였다.
상업적 고려가 최우선인 요즘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무참한 비극 역시 작가 특유의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들의 사랑과 원망을 받던 때였다. 그중에서도 동양 신화를 보는 듯하던 <불의 검>, 프랑스혁명을 다룬 <테르미도르>를 그린 김혜린과 미래 종말을 앞둔 인류를 담은 SF <1999년생>, 모계사회의 여왕과 그 딸들의 이야기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그린 신일숙, 현실적인 고교 성장물인 <17세의 나레이션>과 유려한 드라마가 돋보인 SF 경찰물 <라비헴 폴리스>의 강경옥, 이 세 작가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0여 년간 신드롬을 이룬 한국 여성 작가의 여성향 만화의 중심에 있었다. 거북이북스에서 북펀드를 통해 재출간한 <아르미안의 네 딸들> 레트로판 20권 세트는 펀드로만 1억 원을 돌파(124,676,800원)하며 그 시절 만화를 읽던 독자들의 애정이 현재진행형임을 일깨웠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은 많은 독자들의 인생작이에요.” 하고 말을 전하자, 신일숙 작가 본인에게도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작품 하기를 참 잘했다 싶죠. 이 작품 할 때 무척 힘들었거든요.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고, 많은 돈을 번 작품도 아니에요. 인생 작품이라는 독자들의 말이 아주 고맙죠. 진짜 인생 작품.”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연재하시던 동안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새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작가님께는 마감의 고통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출판 만화, 단행본으로 만화를 내던 시절이라서 지금 같은 마감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제가 마무리해서 원고를 가져가면 그게 마감이었어요. 한 권당 석 달을 넘기지 않으려는 기준은 있었죠. 보통은 두 달 좀 넘겨서 한 권.
연재 당시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권당 몇 부 정도 찍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니까. 그때는 시스템이 그랬어요.
이메일이나 댓글이 없던 시절인데 독자 반응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팬레터뿐이었어요. 출판사로도 오고 집으로도 오고 팬레터가 꽤 많이 왔어요. 내용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일기를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 얘기를 써서 보내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나도 작품을 통해 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사실 작가에게 팬레터를 보내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용 전개에 대한 청원이잖아요.
네. 주로 들은 간절한 얘기는 미카엘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부탁이 작품에 영향을 끼쳤나요?
전혀.(웃음)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데…’ 했죠.

작품을 시작하실 때 내용 전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작하셨나요?
시작할 때 전체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죠. 경부선 공사를 예로 들면 정차해야 할 주요한 역을 먼저 잡아두잖아요. 그 길을 따라 나머지 역을 몇 개 만들지 정하고. 그런데 철로를 놓다 보면 굴을 뚫어야 할 때도 있고 다리를 놔야 할 때도 있어요. 산을 돌아서 갈지 관통해서 갈지도 정해야겠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뼈대는 다 결정되어 있는데, 가다 보면 예상 밖의 지형지물이 있어서 고비를 통과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음 역까지 도달하는 경로 등을 정하면서 가죠.
결말과 분량은 애초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인가요?
결말은 예정한 대로. 책 분량은 공사 기간처럼 예정에 맞추는 일이 순조롭지 않죠. 어떤 인물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스토리가 커지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에피소드가 추가돼요. 그러면 결말은 결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자꾸 다른 곳으로 새니까 이야기를 쳐내는 일이 중요하죠.
작가님께 만화의 즐거움을 알게 한 10대 시절의 기억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나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순정 만화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순정 만화라는 장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자 만화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아니면 명랑 만화였는데 그것도 보면 재미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단행본 유통과 관련한 총판 문제가 있었고, 순정 만화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책이 아예 안 나오던 거였어요. 그 뒤 <캔디 캔디>가 인기를 끌고 일본 만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순정 만화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작가님께서 만화가로 작업을 시작하신 때는 한국 순정 만화들이 창작되던 초반이었을 텐데, 만화가로 살아가기로 정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에 황미나 작가가 이미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김혜린 작가의 <북해의 별>도 있었고. 나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습작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2년 정도.
<아르미안의 네 딸들> 관련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셨나요?
당시에는 책도 변변치 않았고, 인터넷도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헌책방에 가서 <역사전사>라는 책을 샀어요. 도서관도 여러 곳 다니며 관련 자료를 읽었고. 고대 민주정치에 대해서는 논문도 찾아 읽었어요. 볼 수 있는 건 전부 보려고 했고, 몇 번씩 읽으면서 달달 외우려고 했어요.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다시 읽기도 하시나요?
3년에 한 번은 정독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독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완결한 직후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서 잘 안 읽었거든요. 이제는 재미있게 보곤 해요, 저도.
글 이다혜
<씨네21> 기자, 북칼럼니스트. 팟캐스트 <이다혜의 21세기 씨네픽스>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진행.
<출근길의 주문> <코넌 도일> <아무튼 스릴러> 등을 썼습니다.
이미지제공 거북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