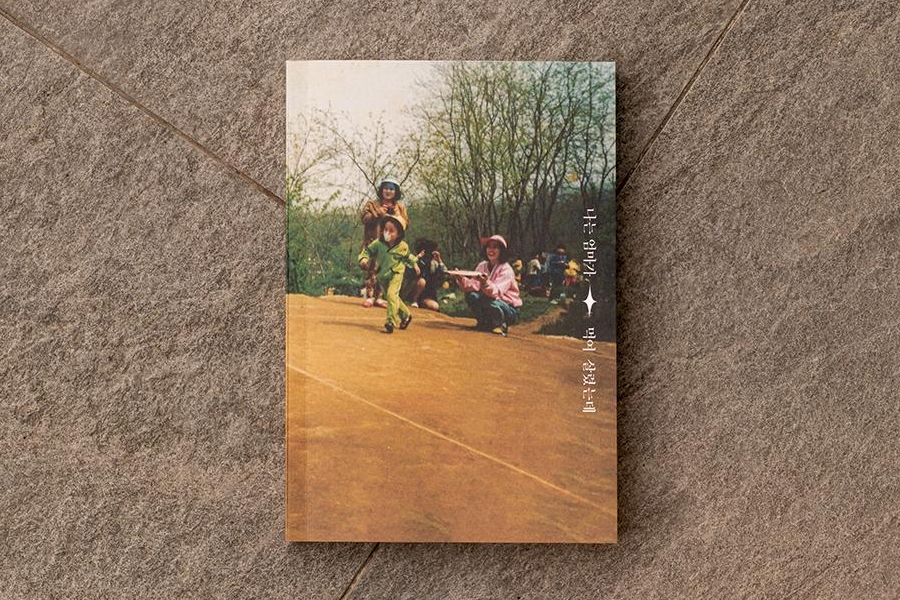샐러드. 생야채나 과일을 주재료로 하여 마요네즈나 프렌치드레싱 따위의 소스로 버무린 음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내가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샐러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레몬이나 요거트 맛 등의 드레싱을 사다놨지만 어쩐지 손이 안 가서 드레싱 없이 채소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다.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레싱 없이 채소를 먹는 건 고역으로 알려진 듯했다. 맛있는 드레싱이 많은데 굳이 채소를 맛없게 먹어야 하냐는 것이다. 처음부터 드레싱 없이 샐러드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쌈채소를 먹곤 했기 때문에 채소의 맛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굳이 갖은 채소를 사서 섞을 필요도 없다. 마트나 편의점에는 새싹채소부터 잎이 큰 채소까지 섞인 샐러드용 모듬채소를 판다. 세일 타이밍을 잘 잡으면 천원에서 3천 원 사이에 푸짐한 모듬채소를 살 수 있다. 평소에도 음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배추나 양상추, 양파부터 청경채, 방울토마토, 로메인, 적근대 등의 채소도 섞여 있다.
드레싱 없는 샐러드는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음식이었다. 일단 한번 떠먹을 때마다 흘러내리는 샐러드드레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곁들이는 음식에 상관없이 푸른 채소가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 설거지도 편리하다. 맛도 단지 ‘풀맛’으로 요약할 수 없다. 앙증맞은 새싹채소 모듬은 줄기를 씹을수록 은근한 매운맛이 났고, 배추에선 단맛이 났다. 쓴맛이 두드러지지만 커피나 한약과는 다른 치커리도 있다. 채소가 다 떨어질 때마다 마트에 가는 걸음도 즐거워졌다. 다만 이 다양한 채소의 맛에 익숙해지면 직접 채소 종류를 골라서 나만의 샐러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글|사진. 황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