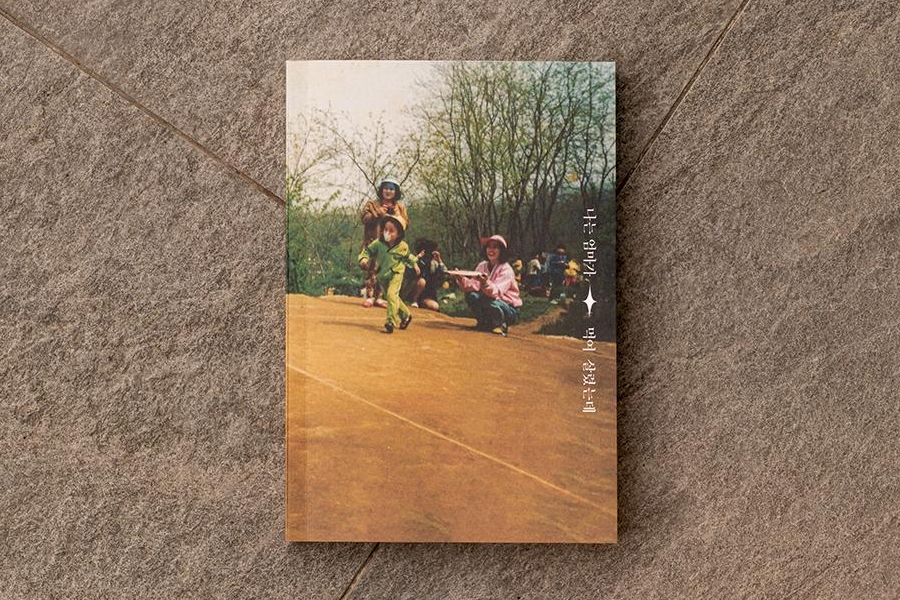'이 글은 《빅이슈》 216호에 실려 있습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종손의 첫째 딸로 태어났다. 두 명의 동생들 모두 딸이었다. 두 살 터울의 첫째 동생은 남자 이기를 기대한 이름을 가졌다. 열네 살의 봄날에, 태어난 막냇동생의 성별을 전화로 듣게 됐을 때 ‘아, 또 딸이구나….’라는, 알게 모르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 생각한다. 엄마는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구나. 퉁퉁 부어 창피해하는 나이든 산모, 엄마를 보면서 나도 창피했다. 외갓집에 갈 때면 외할아버지가 민망해하는 얼굴로 아빠에게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라는 말을 밥 먹듯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어른들은 이상한 말을 하는 존재였다.
중제-“여자는 오줌 눌 때도 소리가 안 나야지”
“여자는 오줌 눌 때도 소리가 안 나야지.” 열다섯 살 때 들었던 작은아빠의 말 때문에 성인 언저리까지도 소변을 누면서 레버를 내렸다(물이 내려갈 때 어마어마한 세균이 튄다고 생각하면 열 받아서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진다) “넌 여자애가 왜 이렇게 드세니?” 열두 살, 먼저 공격한 건 남자아이였음에도 치고 박고 싸우는 나를 향해서 소리치던 담임교사의 말. 그리고 의기양양하던 그 남자아이의 얼굴.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며 푹하고 습했던 그때의 내음을 맡은 건 나뿐이었을까.
절하는 남자들의 엉덩이

ⓒ 차례사진_로이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사 때 절하는 남성들을 바라보는 지영과 지영의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카메라 앵글 사이에 슬쩍 올라오던 그 엉덩이. 그리고 엉덩이들을 바라보는 두 명의 여성.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엉덩이들을 보는 일이다.
명절 때 누군가 늦거나 오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으며 며느리를 욕했다. 사실상 며느리가 되었을 때 욕먹지 않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며느리들을 욕했고, 습관적으로 ‘요즘 며느리’라는 말을 붙였다. 결혼하지 않은 딸에겐 커피를 타서 돌리는 역할을 시켰다. 며느리든 딸이든 그 공간에서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 그림자들 사이로 제사의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면 자고 있거나 TV를 보던 남성 친척들이 슬그머니 일어나기 시작했다. 꽤 괴롭다는 듯, 귀찮다는 듯, ‘수십 번의 절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는 너스레를 떨며 말이다.
절을 하는 10분 남짓 동안, 친척들의 엉덩이를 빤히 보곤 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몇 평 남짓한 거리가 성별이 작동되는 방식이었다. ‘초능력이 있다면 저 엉덩이에 불이 나게 하거나 발로 차서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다. 되바라진 상상과 무기력한 관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유년 시절이었다.
한국 여성들의 서글픈 초상화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모두가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내팽개쳐진 한국 여성들의 서글픈 초상화이다.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엄마에게 “나는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라며 위로하던 어린 지영의 눈빛에 사회는 무엇을 답하고 있는가. 지영의 빙의는 외할머니, 배우자의 첫사랑,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친구 등의 목소리로, 무언의 압박으로 내몰린 그의 울분과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드러낸다. 누구나에게 꿈과 성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를 낳은 여성에겐 예외다. 이 과정에서 기민하고 비겁하게 숨은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지영의 남편, 정대현이다. 영화에서 정대현은 꽤 선하게 그려지지만 그는 끊임없이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영이 요구받는 희생과 포기를 모른 척한다. 기혼 남성들이 성차별에 일조하며 관습을 재생산하는 방식은 ‘동반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자신을 위치 짓는 것이다. ‘성차별에 반대한다’는 편리하고 간단한 구호는 이렇게 여성의 삶 속에서 다시 미끄러진다.
불행의 연대로 이루어진 ‘우리’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영화에서 할머니는 손녀들에게 “너희들 커서 시집가봐라~ 그럼 그냥 그만이야.”라며 손자인 지영 동생의 삶을 비교하고, 버스에서 쫓아오는 남학생이 무서워 데리러 나오라고 한 지영에게 아빠는 “치마가 짧아서 그렇다, 웃어줘서 그렇다.”는 말로 지영이 느낀 두려움을 가볍게 묵살한다. 지영의 전 직장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터지고 자신도 촬영되었을지 모른다는 동료의 불안을 들은 지영은 공중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
아이를 낳고 찾은 정신과 의사에게 “그냥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 있는 기분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지영. 영화는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며 지영이 겪는 사소해 보이지만 묵직한 사건들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되짚는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은 엄마의 삶에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그 다짐을 갱신시키며 여성들에게 분열을 안기는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황현진 작가는 최진영 작가의 소설 <이제야 언니에게>의 발문에서 작가의 관점을 의미화하며 ‘우리’라는 단어를 ‘불행의 연대로 이루어진 무리’라고 썼다.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포인트가 같았던 뒷자리 여성 관객에게 속으로 물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글 장미꽃뱀
사진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