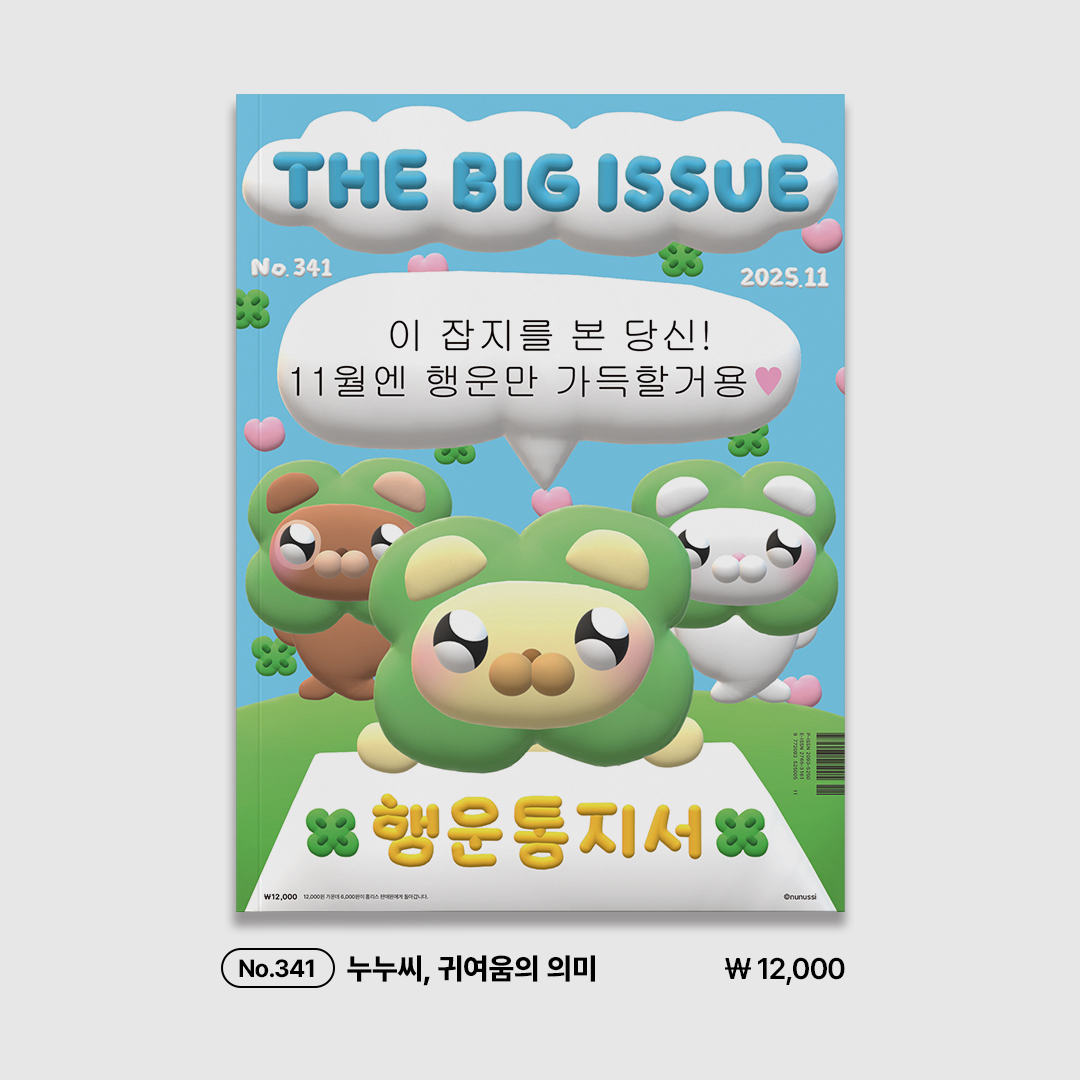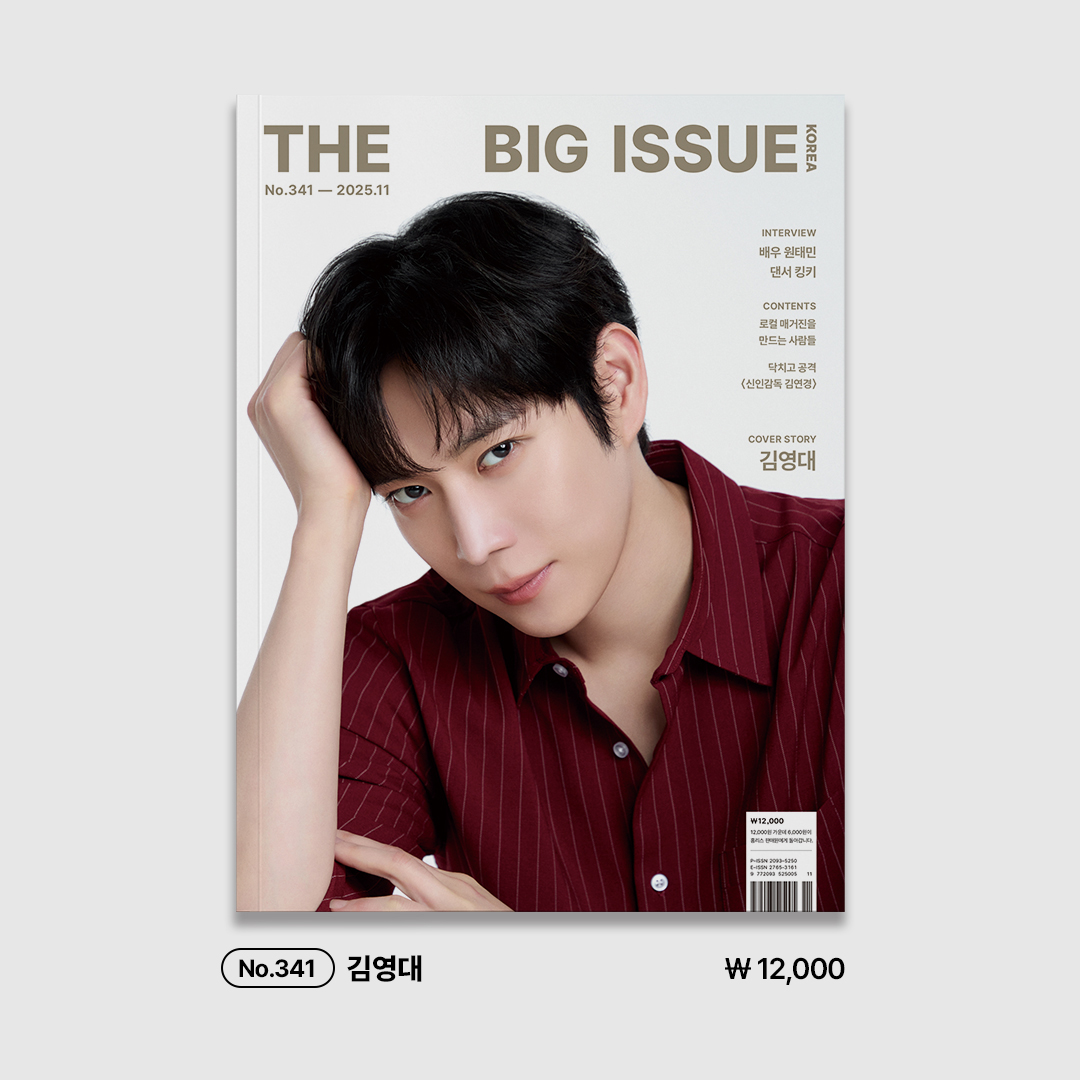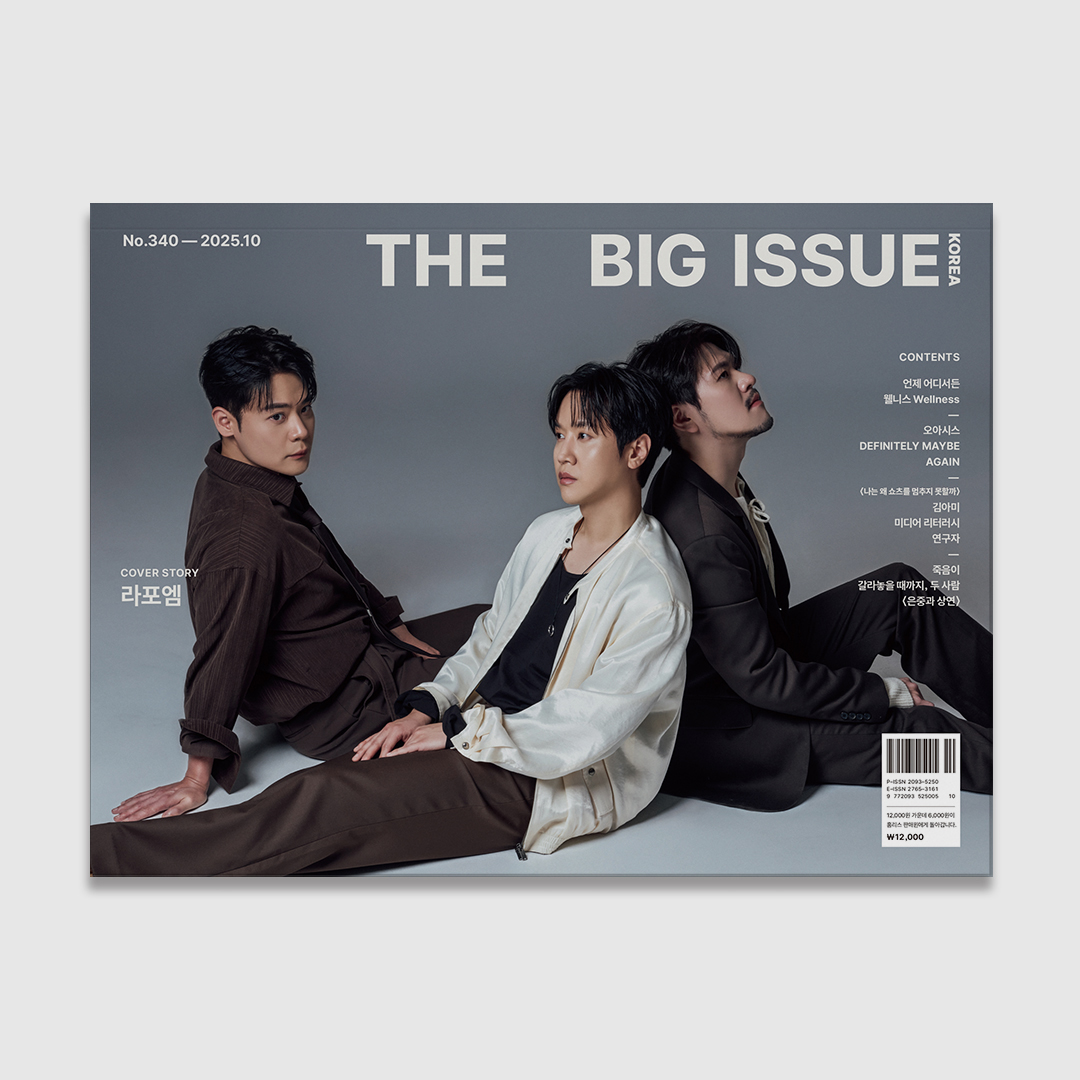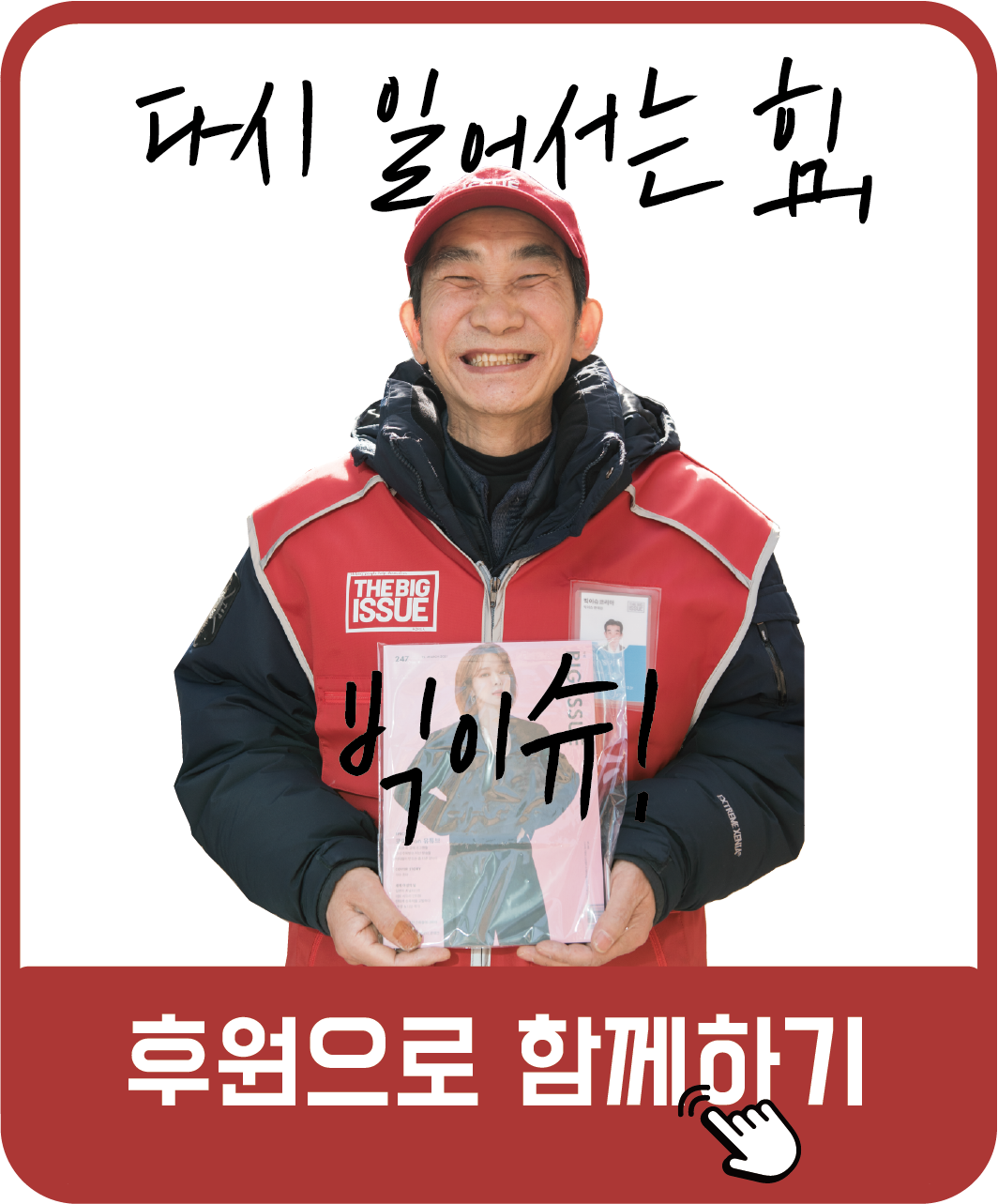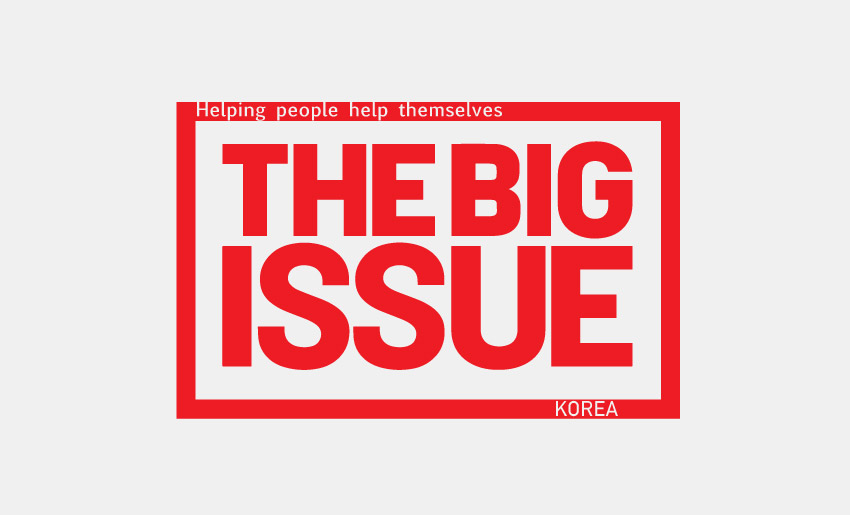이 글은 '모든 극은 그렇게 시작된다 ― 성우 심규혁 (1)'에서 이어집니다.

ⓒ unsplash
“가장 가까운 병원이 횡성의 종합병원인데요. 3, 40분 거리에 있어요.”
아, 신촌에서 잠실까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게 가까운 거리였구나. 길 안내를 하던 종구 형은 이제 아예 길잡이가 되어 나를 차에 싣고 병원까지 달렸다.
“형… 히터 튼 거 맞아? 나 너무 추워…”
팔에 힘은 안 들어가는데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다. 식은땀이 나고 자꾸만 어디선가 <영웅본색> 주제곡을 부르는 장국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의식이 아련해질 때쯤 병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동작조차 해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은 심해져 있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엑스레이실로 들어갔다.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팔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다. ‘맞아, 나는 어려서부터 손 드는 게 참 싫었어. 벌을 서든 발표를 하든.’ 젊은 의사의 도움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비명이 터져나왔는데, 살면서 늘 조그맣던 목소리가 그때 트였던 게 분명하다.
어깨 바로 아래 팔 뼈가 골절되어 있었다. 이연걸처럼 주먹질도 안 했고 <영웅본색>처럼 총질도 안 했는데 팔이 부러지다니. 종구 형은 그대로 날 싣고 서울까지 차를 몰았다.
수술을 했다. 뼈에 철심을 몇 개 박고 팔을 몸통에 바짝 붙여 고정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서 2주를 보내고 대전 집에 내려가 또 몇 주를 지냈다. 스스로 머리도 감을 수 없어서 동생이 감겨주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먹고 자고 책만 읽었다. 그러다 <오디션>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 순전히 제목 때문에 읽었다. 성우 공채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오디션으로 치러진다. 혹시 이 책 속에 합격의 열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
배우로 살려면 제정신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게 더 낫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연기를 할 수 있겠는가. 연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저것 따져본 후에도 여전히 연기를 하고 싶다면, 브라보!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것을 인정해라. 배우들은 대부분 제정신을 찾으려고, 억지로 평범해지려다가 불행을 자초한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면 배우로 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오디션>, 마이클 셔틀르프 지음, 김이선 옮김, 지안출판사, 2009.

ⓒ unsplash
기대했던 바와 달리 오디션의 열쇠 대신, 그 시기 내내 하던 고민의 답을 찾았다. 이 문장을 만나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친 사람이 무슨 학원 하나 옮기는 문제로 그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인가. 그 길로 새 학원을 알아봤다. 팔이 회복되자마자 둥지를 옮겼다. 그리고 매일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식시켰다. 평범해지려다가 불행을 자초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운이 났다. 그때부터 연기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누가 듣기에 좋은 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 어깨에 철심까지 박혀 있으니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힘이 실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내가 도저히 시험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그해 처음 본 시험이 대원방송 2기 공채시험이었다. 5차에 걸쳐 시험을 봤다. 시험이 너무 길어서 미친 시험이라고들 했지만, 더 미칠 게 없었던 나는 합격을 하고 말았다.
다치거나 미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하면 너무 비약일까?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배우들이 멀쩡해 보인다면 그들이 정말 멀쩡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연기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날에는 사고도 없지만, 기적도 깃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든 극은 균형을 잃으며 시작된다.
글. 심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