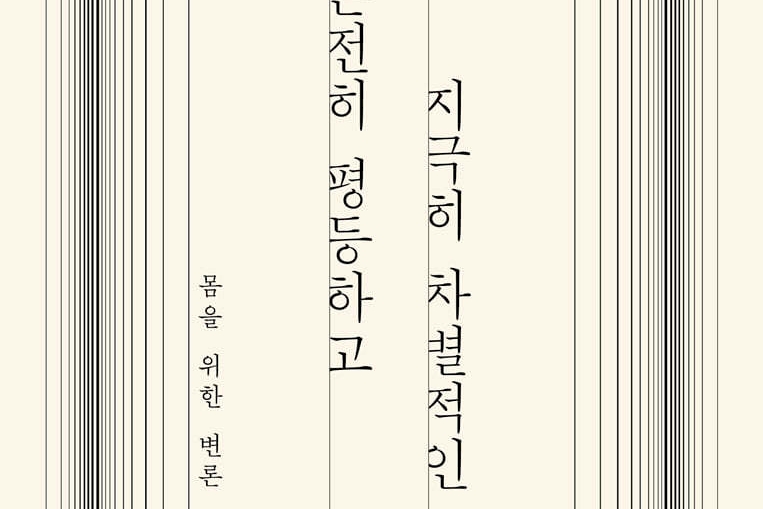글. 김윤지
날이 더워지자 어김없이 정주행을 시작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 그 당시에는 대체 왜 삼식이(배우 현빈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이름은 현진헌이지만, 작중에서도 주로 별명인 삼식이로 불려서인지 이쪽이 더 익숙하다.)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가. 뭐든 자기 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하무인 삼식이보다는 삼순이(김선아)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줄 아는 데다 대화 코드도 잘 맞았던 맞선남이 삼순이의 진정한 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다. 심지어 맞선 이후에도 몇 번씩이나 우연히 마주친 걸 보면 맞선남이야말로 정말 삼순이의 운명이었을지도….
작중 삼순이의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삼순이에 대한 감상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낀다. 방영 당시엔 워낙 어리기도 했고, 삼순이가 노처녀라는 사실을 귀에 닳도록 강조를 해대는 탓에 서른이란 숫자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서른이란 나이는 너무 어리다. 정말 ‘고작’ 서른인 거다. 고작 서른의 나이에 업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파티시에라니.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출신에 유명 호텔 계열 레스토랑을 거쳐 개인 디저트 가게까지 연 삼순이와 내 커리어를 괜히 비교해보게 된다.
내 나름 새 출발을 준비하던 재작년엔 삼식이와의 이별 후 새 삶을 살겠단 다짐으로 한라산에 올랐던 삼순이를 따라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삼순이의 나이에 가까워진 2024년의 여름. 비빔밥에 소주를 곁들여 먹는 삼순이를 보다 밤중에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사왔더랬다.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고 싶어 양푼비빔밥까지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비빔밥과 소주의 조합은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쁘지만은 않은 도전이었다. 내년 여름엔 또 삼순이와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마지막 화를 재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