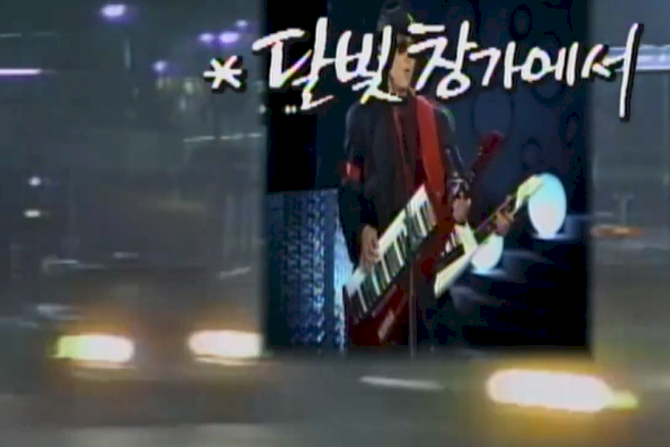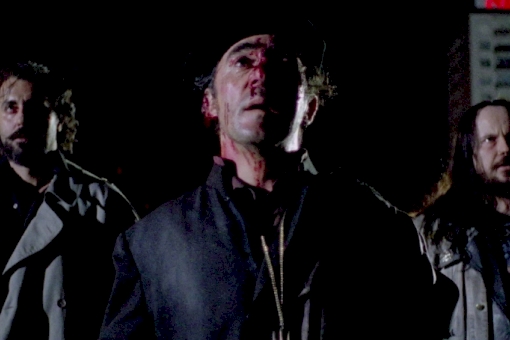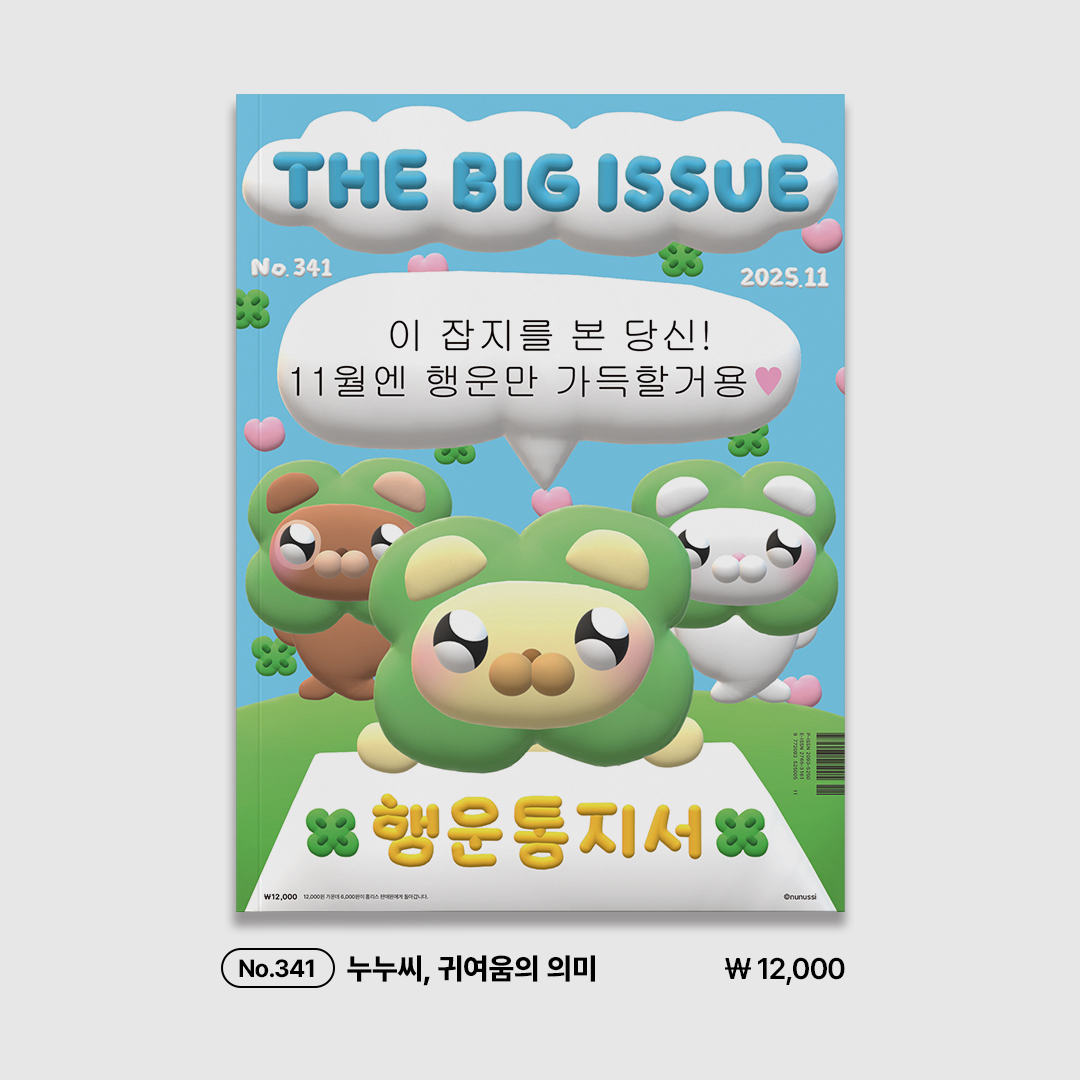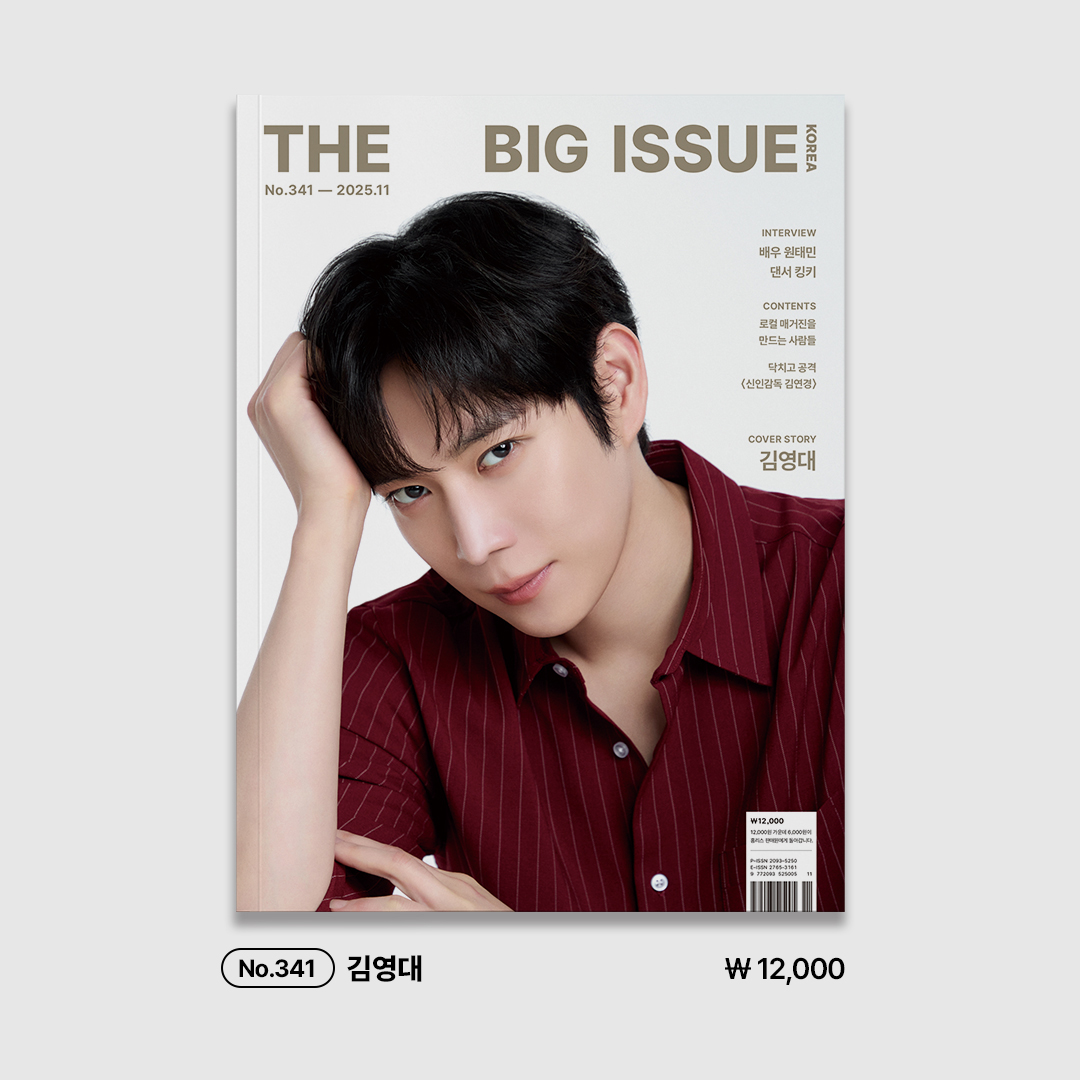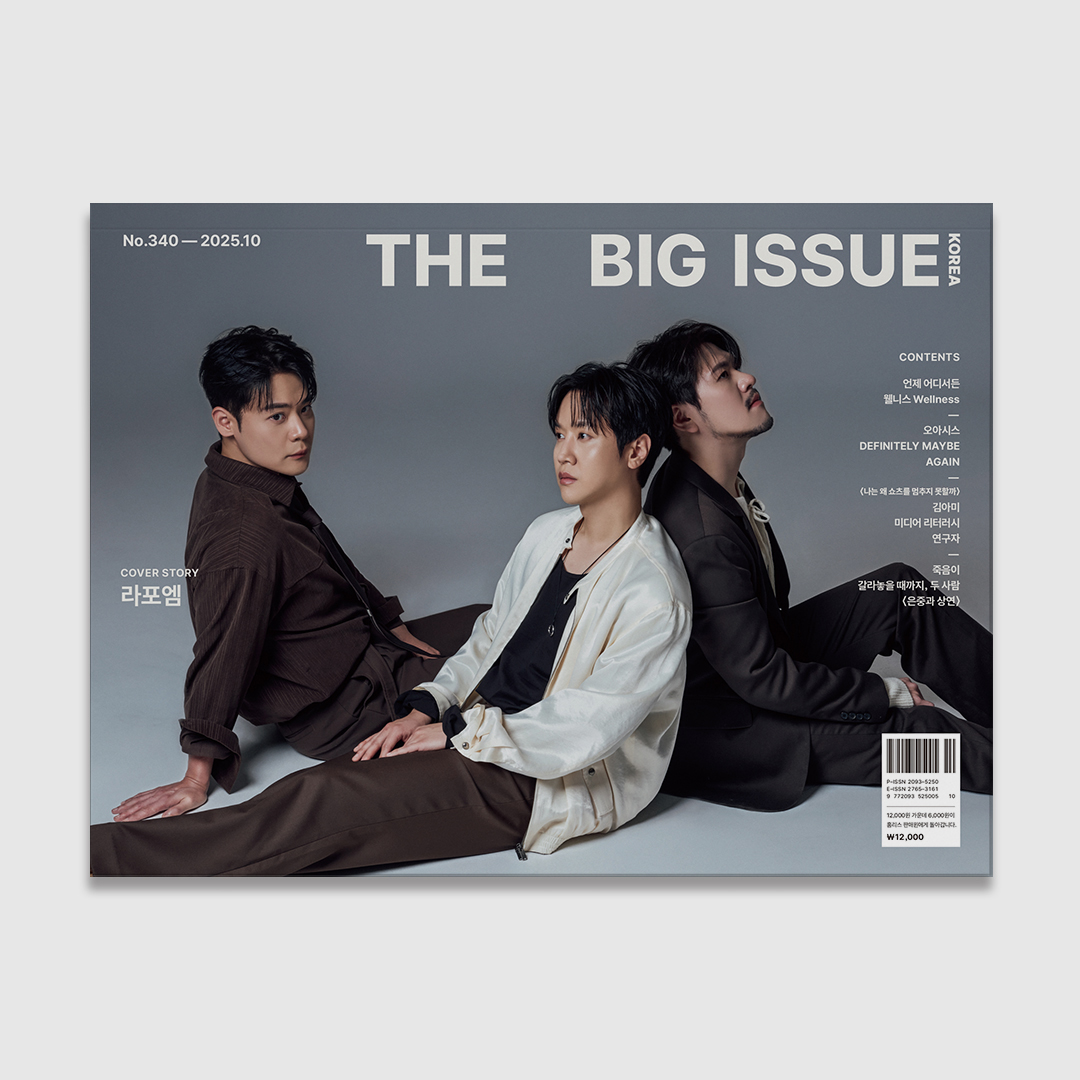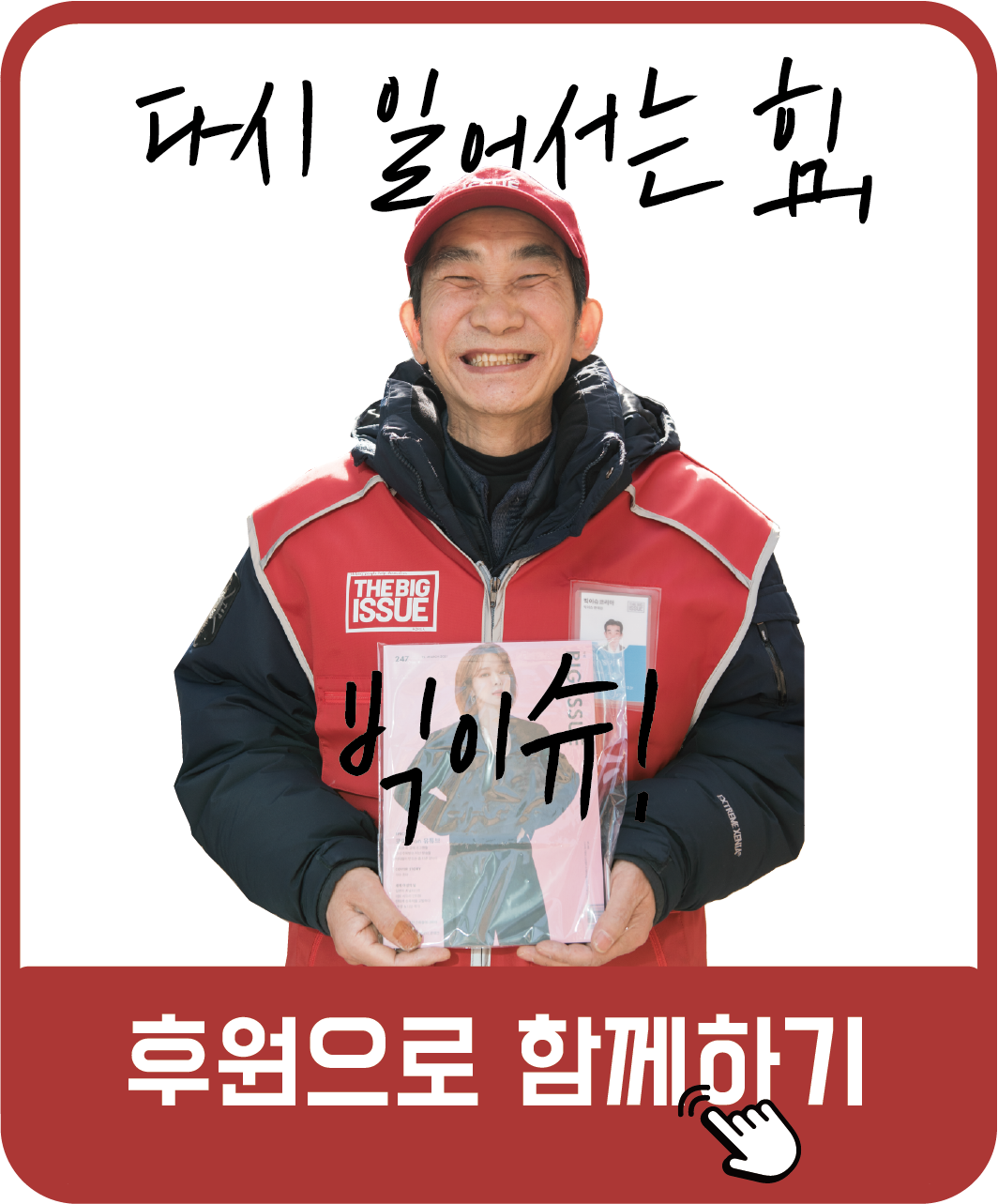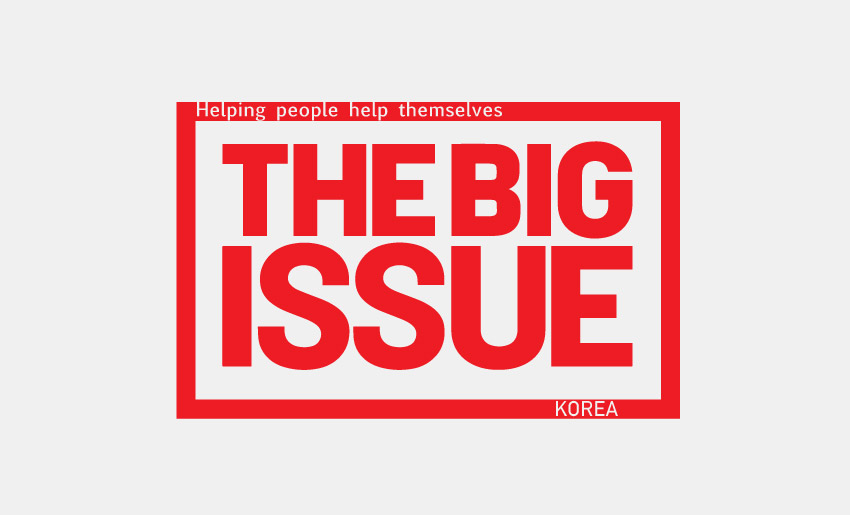글. 김선아 | 사진제공. 녹색연합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켠 차를 타고 국도를 지나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안내다. 길게 뚫린 고속도로를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도 이 안내가 나오면 늘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 달리는 차 앞으로 언제 어떤 짐승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뒷목이 바짝 선다. 운전자인 나는 눈앞에 동물이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에서 나는 마치 1초를 1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군다. 우선 백미러를 보고 뒤 차와의 간격을 살핀다. 차가 없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적을 울리며 비상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짐승의 코앞에서 오래된 내 차는 겨우 멈춰 선다. 기어를 P에 두고 트렁크를 열어둔 채 짐승이 갓길로 자리를 옮기고 유유히 숲길로 들어가는 동안 출몰 신고를 한다. 동승자에게 이런 상상을 나눌 때면 “쳐야 사람이 산다”, “자동차가 고장난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와 같은 현실적인 대답을 듣는 때가 많다. 하지만 나의 선택지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살기 위해 갖다 박는 옵션은 없다.
“너는 눈코입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엔 유독 동물과 관련된 소품이 많다. 학창 시절부터 서른이 넘은 지금도 그렇다. 20대 후반 언론사 인턴을 할 당시 사용하던 내 책상 사진을 보고는 한 친한 친구가 왜 이렇게 눈코입이 많냐며 “눈코입 투성이”라며 웃은 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 열한 살에 만난 반려견 ‘깜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부터 눈코입이 달려 있는 비인간 생명체나 그가 담긴 물건들에는 지금까지 늘 시선을 빼앗겨 지나치지 못해왔다. 녹색연합에 들어와 1년간 일하며 ‘새충돌 저감 캠페인’을 담당할 때 가장 힘들여 일했던 이유일 테다.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커다랗고 진한 동공, 그 아래 오밀조밀 모여 있는 코와 입. 두려움이었다가, 정복의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이용과 보호 그 어디쯤에 있는 야생동물. 언제나 동물을 만나는 건 반갑지만 흔적조차 보고 싶지 않은 곳은 바로 도로 위다. 방금 전까지 만질 수 있는 따뜻한 덩어리로 존재했을 각종 생명체들은 도로 위에선 마치 걸레짝처럼 납작 짓눌려 2D가 되어 있다. 도심과 농촌, 그리고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는 공간까지 어디 하나 눈코입 달린 비인간 생명체가 자유롭게 다닐 공간은 없다.

차라리 새가 토마토나 돌멩이라면
도로에 포유류 로드킬만 있는 건 아니다. 몸집이 작아 자세히 살펴야만 볼 수 있는 죽음들이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00만 마리, 하루 평균 약 2만여 마리의 새가 사람이 만든 투명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는다. 새의 눈은 머리 양쪽에 위치해 바로 앞의 유리창을 발견하기 어렵다.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복지연구실장은 “불행히도 새는 토마토도 돌멩이도 아니라, 유리창을 더럽히지도 깨뜨리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새들의 조용한 죽음에 기대 우리는 여전히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유리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날기 좋게 만들어진 가벼운 새의 몸 덕분에 투명 인공구조물은 거의 손상이 없다. 만약 새 충돌로 인공구조물이 깨지거나 피로 붉게 물든다면. 보기 좋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인공구조물을 수리하는 데 지속적인 비용이 든다면 사람들은 진작에 충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끝냈을 것이다. 단지 인간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보기 좋다는 이유로 도로 방음벽, 건물 유리창, 기타 인공구조물들은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명하게 만들어져왔다. 지난 6월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개정 야생생물법이 시행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단순 권고에 그친다. 시행 1년이 넘은 지금도 농촌과 도심을 불문하고 새 충돌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다.
“유.난이다, 유.난”
녹색연합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로 “세상에 인간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는 뭐든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자라며 배우기 쉬우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환경문제만 해도 어떤 걸 우선으로 다룰지 정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데’, ‘인간과 자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데’ 하는 생각들이 친절히 응대를 하는 입과는 따로 꼬리를 물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다. 죄송하게 됐지만 나는 지금 ‘비인간’이 먼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수많은 발전으로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비인간 ‘눈코입’들은 자꾸만 뒤로 밀린다. 개정 야생생물법처럼 제도가 바뀌었어도 자유롭게 살면 그들은 아직 죽는다.
여유로워서 활동가가 된 게 아니다. 인간 문제에 관심이 덜해서 환경 활동가가 된 것도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을 살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해 녹색연합에 들어왔다. 작은 새들의 조용한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일은 야생동물 보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된다. 비인간 생명을 살필 수 있는 사회에서 노동, 인권 등 수많은 인간 문제들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끼리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비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필요조건이 돼야 한다. 어쩌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활동을 보고 누군가는 “유.난이다. 유.난”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는 유난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유난하게 살겠다.
김선아
녹색연합 이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