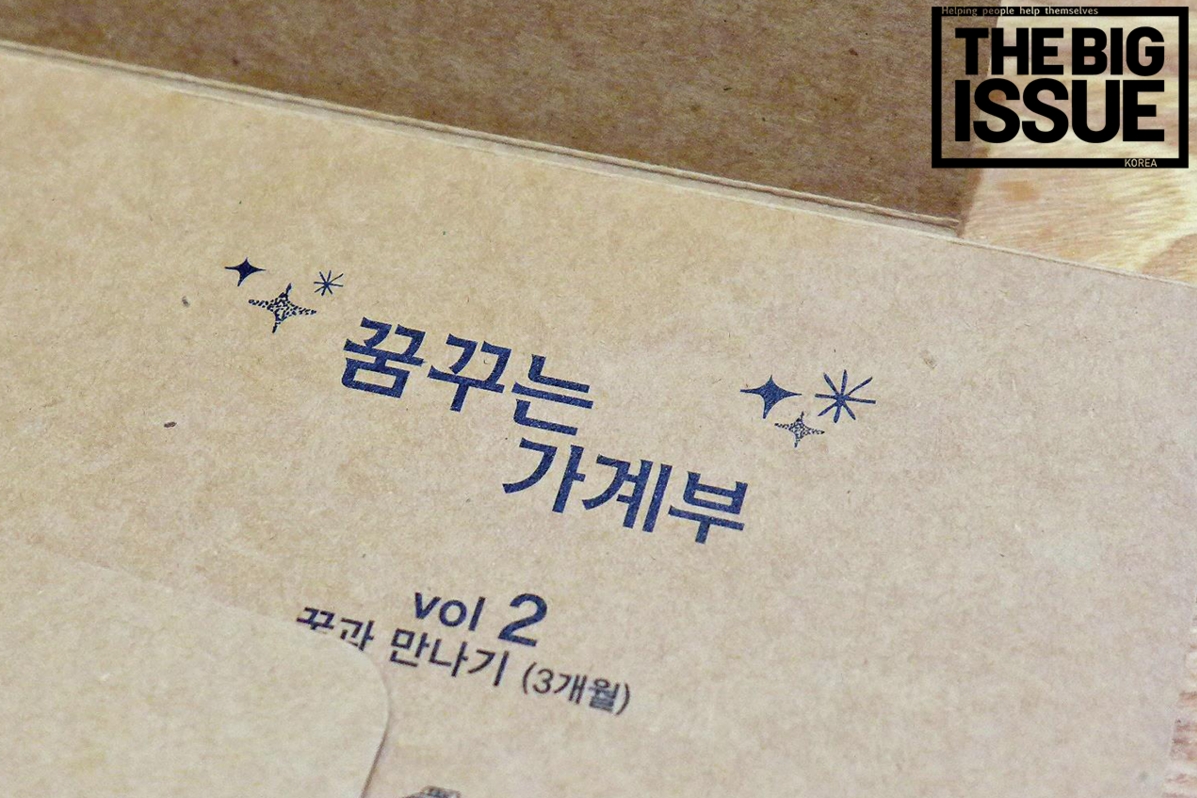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래서일까,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더욱이 나의 결과 비슷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엔 작은 울림이 생긴다. 연남동 끝자락에 위치한 아트 플랫폼 ‘다이브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길 바란다. 추천컨대, 마음이 소란해지면 이곳, 다이브인에 가보자.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옷걸이를 찾았다. 내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 머물 때, 입고 온 옷을 거는 행위는 그곳에 안착하기 위한 나만의 준비 과정이다. 작은 방 안에는 사다리처럼 생긴 나무 행거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고, 두 개의 옷걸이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입고 온 진녹색 재킷과 검은색 셔츠의 어깨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또 바지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옷걸이에 하나하나 잘 걸어두었다.
첫 번째 과정을 마치고 나니 그제야 내가 하루 동안 묵을 숙소가 눈에 들어왔다. 공간에서는 옅은 무게감이 느껴졌다. 옅게든 짙게든 어떤 공간에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그곳에 놓인 물건들이 완벽하게 한 팀을 이루고 있을 때다. 경의선 숲길을 향해 시원하게 뚫린 네모난 창, 창을 내다보며 나무 바닥에서 솟아 있듯 자리한 캄포나무 테이블. 운율이 느껴지던 삼베로 디자인한 천장 조명, 침대 위에 다소곳이 올려진 전통 문양의 작은 베개까지, 색감과 질감이 잘 맞춰진 10평 남짓한 이 공간은 무언가에 집중하며 시간을 채우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다이브인,
작품을 경험하는 곳
내가 머문 곳은 연남동 끝자락에서 ‘다이브인(DIVE IN: ~에 빠지다, 무언가에 빠지는 경험을 해보자는 뜻)’이 운영하는 아트 스테이(Art stay)다. 20년가량 된 연립주택 두 채를 리모델링해 하나는 작가들의 아틀리에로, 하나는 예술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숙소, 아트 스테이로 활용하고 있다. 내가 옷을 걸었던 행거, 차를 마시기 위해 마주했던 테이블, 밤 사이 우리의 공간을 밝혀준 조명 등 그 안에 담긴 소품은 모두 작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었다.
다이브인은 소비라는 개념보다는 시간을 즐긴다, 혹은 경험을 쌓는다는 말이 어울리는 공간이다. 일단 이곳에 오는 과정이 경험의 시작이다. 다이브인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경의선 숲길을 따라 천천히 자연을 음미하며 숲길의 끝자락까지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물론 마을버스로 갈아타거나 택시로 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느리게 오다 건물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민 ‘DIVE IN’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숲길에서 나와 그곳을 향하다 보면 이색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집집마다 빨랫감이 널려 있고, 정성스레 키우는 화초들이 즐비해 있는 단층집들, 집 앞마당에서 햇볕 아래 느긋하게 오후를 즐기는 지역민들, 그들의 몇 발자국 옆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책방 안에서 책을 고르는 외지인이 섞여 있다.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는 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과 외지인들이 어우러진 연남동 끝자락에서 다이브인은 작가들과의 공생을 꿈꾼다. 작가들이 다이브인의 아틀리에에서 생활하며 영감을 얻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소비자들은 이곳에 와 작품을 감상한다. 감상은 갤러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갤러리는 훑고 지나가는 곳이 될 수 있으니, 작품에 대한 인상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 스테이를 구상했다. 스테이에 머물며 작품들과 시간을 보내다 정이 들면 구매를 하거나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긴 호흡의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현재 2층 스테이를 가득 채운 울(wool)로 만든 베딩, 조명, 코타츠 (담요를 덮어 사용하는 난방기기) 등은 이 시나리오를 통해 완성한 작품이다.

이렇듯 ‘예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쉽게 들어가려면’ 이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는 다이브인. 굿즈는 잘 사면서, 원화를 사는 데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보며 작품 구매의 문턱을 낮추는 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들이 76mm의 사각 포스트잇 안에 그려준 원화의 축소판을 4월 26일까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소비자들은 1점당 2만 5천 원을 지불한 후, 전시가 끝나면 작가의 날인이 찍힌 원화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원화들 중 무언가는 또 2, 3층 스테이의 벽 한 켠에서 공간에 특별한 무게감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지나고 보니 옅은 무게감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날의 스테이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공간에 잘 안착했던 나는 그간의 소란했던 감정들을 쏟아내며 쌓아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웠다. 캄포나무 테이블에 앉아 경의선 숲길의 끝자락을 응시하면서 깜깜했던 숲길이 밝아지는 과정을 목격하던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다. 왠지 그 테이블과 삼베 조명을 고스란히 내 방 창가에 들여놓고 싶다.
글 박민혜
서울 연남동의 기획 및 디자인 창작집단
‘포니테일 크리에이티브’ 구성원이다.
사진 양경필, 박기훈, Dive in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