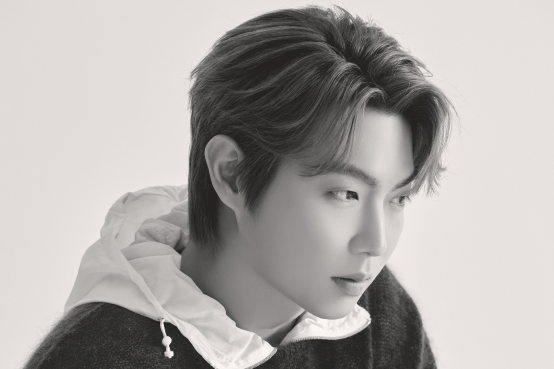서울에서 나의 첫 보금자리는 다섯 평이 조금 넘는 원룸이었다. 침대와 싱크대 사이에 작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갔다. 침대 발치에 작은 텔레비전 하나가 옵션으로 놓여 있었는데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에게 TV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조그만 방에 앉아 TV 속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사랑을 나누고 투탁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울해졌기 때문이었다. 원래 책을 좋아하던 나는 그때부터 TV를 끊고 본격적으로 책을 가까이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즈음 나는 책도 완전히 끊어버렸다.
책이라는 물건은 정말 공간을 잡아먹는 데 귀신이다. 군대에서도 월급을 쪼개 한 달에 네 권씩 책을 사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는 집으로 부치곤 했던 나인데 책을 딱 끊었다. 그렇게 텔레비전이고 책이고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연기 연습에만 매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았다. 그냥 자취방에 아예 안 들어오고 찜질방이나 좀 더 넓은 방에 사는 친구 집이나 연습실, 그런 곳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아졌을 뿐이다.
그런 날들이 지나 어찌어찌 성우가 됐고, 나는 다른 층의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옮기게 됐다. 방이 무려 두 배로 넓어졌다. 하지만 그래 봤자 열 평 남짓, 여전히 책장을 두기에는 무리였다. 그렇게 어느덧 TV도 책도 멀리하는 프리랜서 성우가 되었다. 그때쯤이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종이 대신 매우 신비로운 물건을 들고 녹음하는 모습을 보았다. 바야흐로 태블릿 PC의 시대가 태동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다른 성우들이 마치 청나라 사신단을 본 것처럼 그 선배를 둘러싸고는 아이패드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감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선배는 정말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태블릿의 좋은 점을 쏟아냈다.
1. 프린트하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든다.
2. 이면지가 쌓이지 않는다.
3.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가루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이제 걱정 없다.
4. 수정 녹음이 생겼을 때 해당 대본을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PD가 수정 대사를 불러주고 손으로 받아 쓰곤 하던 때였음)
5. PDF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녹음 기능으로 시사하면서도 녹음을 간편하게 해볼 수 있다.
6. 그 녹음본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내가 잡은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 그만이므로, 골이 터지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
7. 태블릿이 무거운 것 같지만 더빙이 많은 날의 종이 무게에는 댈 게 아니다.
8.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간단하다.
9. 대본 위에 내가 한 표시가 맘에 들지 않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무궁무진했으나 여기까지만 듣고도 나는 생각했다.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다.’ 무엇보다 내가 솔깃했던 부분은 프린터가 필요 없어진다는 점이었다. 열 평짜리 방으로 옮기면서 들여놓았던 거대한 프린터를 다시 치워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패드를 손에 넣은 날, 나는 내 집을 마련한 듯 기쁨을 느꼈다. 이제 책장이 없어도 마음껏 책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책을 사도 방이 좁아지는 일 따위 벌어지지 않는다. 역시 잡스가 우리에게 판 것은 기계나 기술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진정한 독서가로 거듭났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란 그리 많지가 않은 법이다.
전자책을 접하게 되면서 도리어 그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나는 원래 한번 붙든 것을 쉽게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긴 했어도 한번 붙잡은 책을 어떻게든 끝까지 읽어내는 편이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끈기라 믿었건만, 전자책을 통해 그러한 습성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그 실체는 ‘귀찮음’이었다. 구입하고 보니 책이 나랑 좀 안 맞거나 내 수준에 어렵더라도 새로 사러 가기가 귀찮으니 계속 읽어나갔던 것이다. 성우라는 직업이 생김으로써 조금 나아진 경제 상황과 클릭 몇 번만으로 발품 하나 없이 가상의 서재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합쳐지자, 나의 책 보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조금만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새로 샀다. 잘 읽고 있는 책 속에 소개된 다른 책이 있으면 또 바로 샀다. 그렇게 앞부분만 혹은 듬성듬성 읽다 만 전자책들이 쌓여갔다. 그런 책들이 쌓인 만큼 읽다 말고 새로 사는 습관은 점점 강화됐다. 도서 보유량만 늘고 독서량은 구멍 난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언젠가부터는 이런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나의 독서 능력은 이제 맹장처럼 몸 어딘가에 남아 있긴 하지만 왜 달려 있는지 모를 그런 것이 된 게 아닐까? 그런 가운데 그나마 독서 능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직업 덕분이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성우의 일에는 필연적으로 ‘독서의 과정’이 수반된다. 성우가 일을 할 때에는 늘 대본이나 멘트, 즉 어떤 형태로든 텍스트가 주어진다. 그 텍스트를 먼저 읽어서 이해하고 느낀 후 그것을 소리로 만든다. 최종적인 목표는 텍스트를 보았던 나의 이해와 느낌이 소리로도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표현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우는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잘 읽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나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버는 데에만 쓰고 있는 현실. 그 반대가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지만… 이런 현실이 종종 저주처럼 느껴졌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쁜 버릇은 한번 생기면 정말 가족 같아진다. 마치 피로 맺어진 관계처럼 잘 끊어지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집이 조금 넓어져서 나도 책장이 생겼다. 다시 종이책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읽다 만 전자책을 사 모으던 버릇 그대로 이제는 종이책을 뭉텅이로 사 모으기 시작했다. 이쯤 되니 인정할 수밖에… 좁은 집도, 잡스도, 그 무엇도 ‘나’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냥 내가 문제다.
다 읽지 못한 채 가상의 서재에 틀어박힌 전자책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먼지를 뒤집어쓴 채 기침을 하지도 않고, 내 현실의 공간을 단 한 평도 침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그것들은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콘서트장도 놀이공원도 도시도 심지어 사람마저도 가상의 현실 세계로 옮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귀찮음’이 아닐까.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귀찮음’의 최대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녹음 스튜디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음 때문에 엔지가 날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탄생하기 위해서 귀찮은 시사와 연습의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다. 프린트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은 시간과, 표시를 쉽게 고칠 수 있게 되어 생긴 여유를, 더 귀찮은 시사와 연습 쪽으로 기꺼이 밀어 넣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은,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 더 많은 사진과 기사 전문은 매거진 '빅이슈'268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 심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