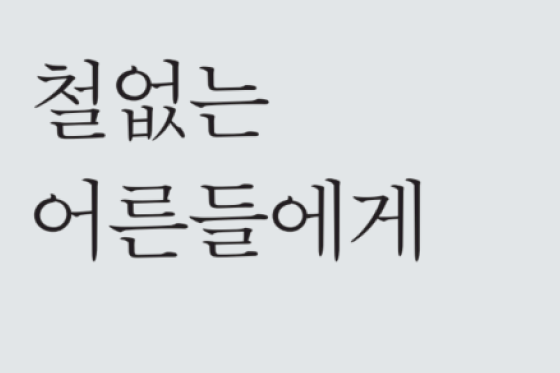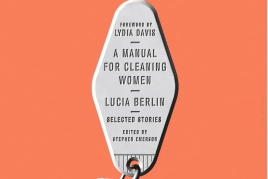글. 유지영
내가 개 밤이와 자주 향하는 집 근처 공원의 한 낡은 2층 건물에는 요즘 보기 드문 중정(中庭)이 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 복도를 지나 문을 열면 바로 중정으로 갈 수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그 중정의 중앙에는 커다란 목련 나무가 있다. 의자 몇 개와 테이블 하나, 목련 나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에 목련 나무 한 그루가 가져다주는 조용한 존재감이란 대단했다. 그 목련 나무에 꽃이 피는 봄에는 밤이와 늘 그 중정에 들러 목련을 감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다.
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목련꽃 봉오리가 맺히고, 이내 하얀 목련꽃이 기지개를 펴면서 피어나기 시작한다. 목련꽃은 잎이 무거워 언제 시들어 나무 아래로 떨어질지 알 수 없기에, 봄에는 매일매일 그 목련꽃이 피고 지는 걸 관찰하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흰 목련꽃은 특히 밤에 그 진가를 발휘했다. 그러다 목련꽃이 다 떨어지고 진한 녹색 잎이 나기 시작해 잎이 나무를 온통 뒤덮으면 비로소 여름의 시작이었다.
올해 초, 목련꽃이 봉오리를 맺을 준비를 하는 때였다. 중정으로 들어가는 문 한가운데에 공원 소장의 이름으로 “폐쇄. 해당 장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전? 그 시기 나는 매일 중정에 방문했고 중정은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목련 나무 외에는 안전사고가 날 만한 게 없었다. 화가 나서 왼쪽 오른쪽 문고리를 돌려보고 힘껏 비틀어봤으나 단순히 잠금장치로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주변에 단단하게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개의 문은 앞에 모두 안내문이 붙었고 잠겨 있었다.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청 내 공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정을 폐쇄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걸기 전까지 담당 공무원은 중정이 폐쇄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매일같이 가던 곳을 이제는 못 가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온통 울렁였지만, 간신히 억누르고 그에게 한참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원 관리의 주체인데 건물 내 중정이 폐쇄된 걸 왜 모르는지, 그러면 공원 소장이 있는 서울시의 하청 업체가 공원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내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 것이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반드시 쓰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간 무언가에 맞은 듯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다. 나는 순간 중정에 있는 목련 나무를 떠올렸다. 내 상상 속 목련 나무는 아주 고요하게 꽃잎을 떨어트리면서 여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련 나무를 이유로 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아뇨, 그곳을 제가 어떻게 쓰든 중정은 공공의 땅인데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중정을 이렇게 폐쇄하는 것이 맞나요?”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산책은 중정 밖에서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 일 아니냐고.
무신경함이라는 폭력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중정을 반드시 폐쇄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원 소장은 중정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한다던데,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요?” 그는 했던 말을 반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중정이 폐쇄됐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므로. 나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켜보고자 그 공간이 내가 아닌 어린아이들도 즐겨 찾는 공간이고, 몇 차례의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소장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와의 통화는 끝나고 말았다.
이후 몇 차례 항의가 더 오갔으나 결국 그 중정은 반년 넘게 닫힌 채로 가을이 왔다. 중정의 문 앞에는 “중정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정을 사랑하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항의의 의미로 붙인 포스트잇이 남았다. 그사이에 거대한 목련 나무는 무성한 잡초에 둘러싸인 채 아직 그 중정에 있다. 매일같이 중정을 들르던 습관 탓에 개 밤이는 아직 그 건물 근처에 가면 안으로 들어가자면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나는 어쩐지 슬픈 기분에 사로잡혀 고개를 젓는다. 반년 사이에 밤이는 중정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좋아하는 공간을 찾았다. 개의 시간은 언제나 인간보다 빠르다.
중정이 얼마나 작든 그 공간은 공공의 소유고, 그렇다면 설령 한 평이더라도 함부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토록 무신경한 행정에 의해 철저하게 배반된다. 이 공원에서 가장 큰 잔디밭은 지난 4월부터 ‘잔디 양생 기간’이라는 명목 아래 8월 말까지 높이 팻말을 세우고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공원에 출입하는 시민들이 통상적인 잔디 양생 기간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양생 기간이 6월 말에 끝난다면서 곧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잔디는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양생 기간을 거친다. 여름 내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잔디밭을 출입하지 못했고, 잔디밭에는 잔디 아닌 잡초가 무성하다. 한때 이 공원에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이 실린 잡지 《빅이슈》의 사무실이 있었다. 빅이슈를 포함해 온갖 사회적기업을 내쫓은 뒤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를 세무서와 지구대로 채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기자로서 취재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한다. 서울시가, 행정이 한 일이니 그래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대개 자신이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일상이 침범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아차리게 된다. 그건 그저 믿음이었다는 것을. 결국 행정도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얼마든지 터무니없는 얼굴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서울시는 나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끝내 중정을 폐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유지영
〈오마이뉴스〉 기자.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함께 만들고 동명의 책을 썼다. 사람 하나, 개 하나랑 서울에서 살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