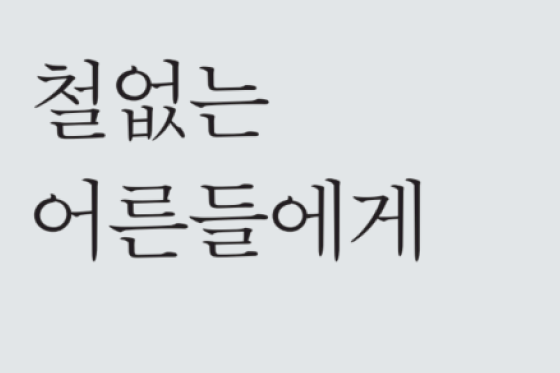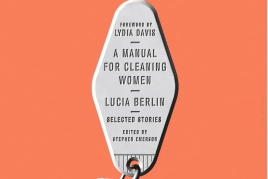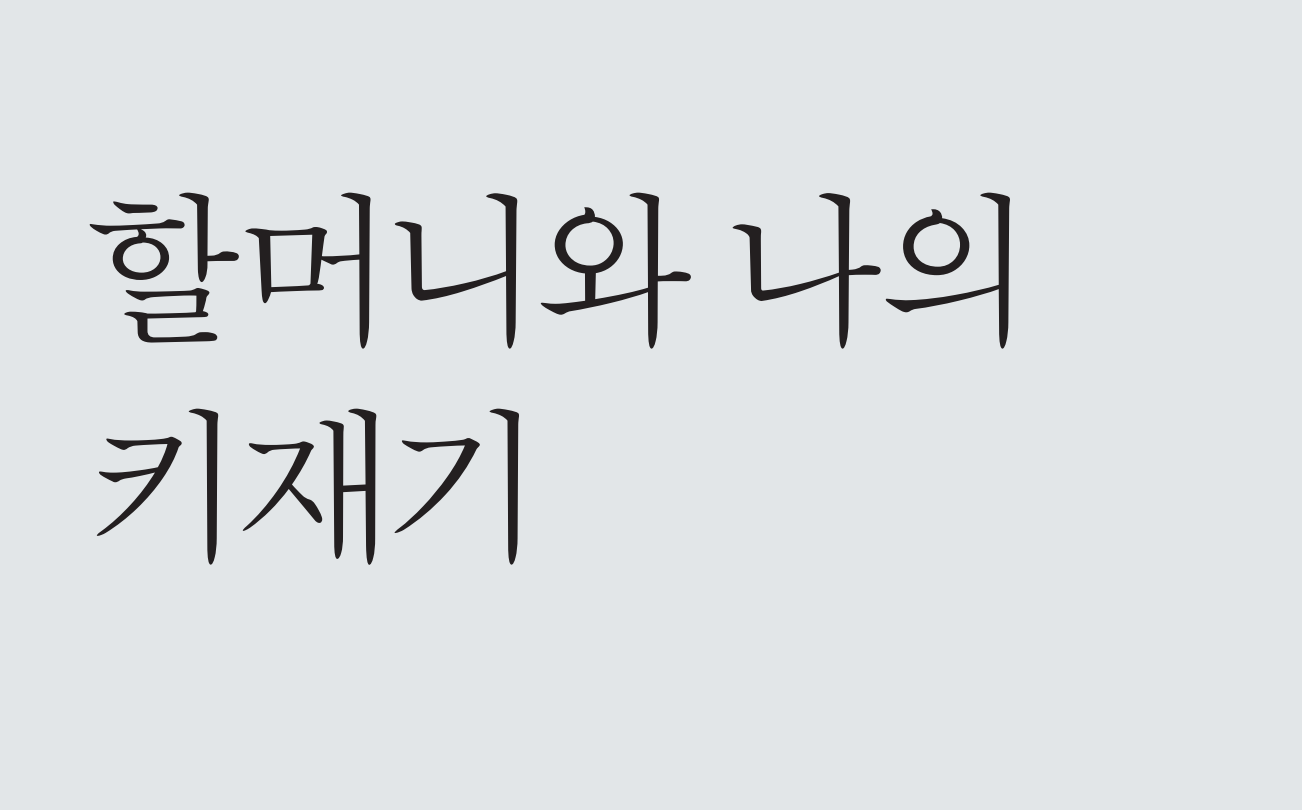
글. 박예은
외할머니의 막내딸이었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할머니는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우리 집으로 잠시 요양을 오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국립중앙박물관에 혼자서 다녀오겠단 것이다. 할머니는 평소 집에 있으면 TV 보는 것밖에 더 하냐며, 집에 있기보단 왕복 두 시간 걸리는 남대문시장까지도 홀로 다녀오시곤 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안 좋을 때면 더욱이 밖으로 나가 마음속 미로의 출구를 찾아보며 걷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든을 넘긴 뒤로는 세 번째 다리인 지팡이를 꼭 쥐고 걷게 되셨다. 그렇기에 나는 할머니가 박물관을 찾아 복잡한 길을 헤매는 모습이 상상되었고, 고생만 하다가 서러워져서 돌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나는 급하게 알바 일정을 조율해 하루 시간을 만들었다.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절대 나오지 마라! 할머니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하며 날 밀치고, 난 “알았어. 문만 열어줄게.” 하며 따라나선다. 할머니는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내심 기뻐하신다. 박물관에 도착해 나는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 뒤에 대령했다. 할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내가 고생한다며 연신 거절하다, 내 등쌀에 떠밀리는 척 앉는다. 이제는 위에서 바라보는 할머니의 정수리가 퍽 당연해졌다.
그러고 보면, 처음 국립중앙박물관을 와본 것도 할머니와 초등학생 때였다. 당시 나는 반에서 줄을 서면 항상 맨 뒷줄에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곧은 허리이던 시절의 할머니에게는 팔꿈치까지 밖에 닿지 않는 키였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를 올려다보면,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드리웠다. 특히 그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다녔는데, 저녁 늦게 퇴근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와 함께 간 적이 많았다. 진료가 끝나면,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병원 뒤편에 있는 창경궁에 갔다.
그 후 나는 성인이 되어 우연히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예전 추억이 떠올라 무척 반가웠다. 홍콩 배우처럼 선글라스에 양복을 빼입은 할아버지, 고운 한복의 할머니, 그 옆으로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자녀들과 덕수궁에서 찍은 흑백사진이었다. 그제야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열심히 창경궁에 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옛날, 할머니에게 있어서 궁궐이란 정성껏 차려입고 아이들과 놀러 가는 특별한 곳이었겠구나.
난생처음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던 나는 해설가를 자처하며 앞장서 걸었다. 얼버무리면서 틀리게 설명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 할머니는 진지하게 들으며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 꼬마 해설가는 이제 할머니의 뒤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직도 그때와 똑같이 눈을 반짝 빛내며 뒤에 선 나에게 물었다. “예은아, 진짜 금일까? 누가 안 가져가나? 이거 녹슬어서 이런 색인 거지?” 조선 왕조 순서도 깜깜해진 나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유물 안내문을 열심히 커닝해본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주는 사랑
휠체어를 운전해 선택한 마지막 종착지는 박물관 내의 찻집이었다. 할머니가 5,000원이 넘는 음료 한 잔 가격에 놀라면서 주섬주섬 현금을 찾는 사이 나는 선수를 치고 카드로 결제해버렸다. 할머니는 아실까. 할머니가 그 시절 나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했던 그때처럼, 할머니랑 느긋하게 앉아 대화하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란 걸. 이런 장소를 어색해하는 할머니에게 말한다. “할머니, 창밖을 좀 봐. 화단의 꽃 이쁘지 않아?” 내가 의자에 앉자,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할머니와 같은 눈높이가 된다. 할머니도 어느새 내가 말한 꽃을 찾아내곤 웃는다.
이제 할머니는 내가 당연하게 쑥 내미는 팔꿈치에 팔짱을 끼고, 부축을 받으며 걷는다. 내 성장판은 168cm가 되어서야 닫혔다. 할머니는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보면서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예은아. 너는 키가 어째 점점 커지고, 할머니는 작아지냐. 너 어릴 때는 할머니가 다 업고 다녔는데.”
“그랬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 어릴 때 병원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거 할 사람이 할머니밖에 더 있냐? 그땐 아기라서 혼자는 못 가. 너는 걸음이 느리지, 횡단보도는 건너야 하는데 좌우로 차들은 쌩쌩 지나가지. 그럼 할머니가 너 업고 종종거리며 다녔지.”
중학생 때 어떤 선생님은 나에게 ‘예은이는 참 사랑받고 자란 아이 같다.’고 하셨다. 좋은 말 같긴 한데, 구체적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의아했었다. 이제야 그때 선생님이 한 말에 고개를 끄덕여본다.
지팡이를 캉! 캉! 짚어내는 소리와 대조되게 느릿-느릿-한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늙어버린 조모의 듬성듬성 빈 머리숱을 내려다보며 걸어본다. 그 밑으로 할머니가 가는 길이 보인다. 할머니와 나의 키재기는 끝났지만, 나는 길마다 불쑥 튀어나온 돌멩이는 없는지 여전히 재어보고 있다. 그리고 그 옛날, 차 조심하며 다녀라, 했던 할머니처럼 말해본다.
“할머니, 앞에 턱! 조심~”
’사단법인 오늘은’에는 아트퍼스트 에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글을 쓰고 나누며 얻은 정서적 위로를, 자기 이야기로 꾹꾹 눌러 담은 이 글을 통해 또 다른 대중과 나누고자 합니다.
박예은
나를 이끄는 목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글로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email protected]